
이른바 ‘국내 빅5 병원’이라 불리는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의 한 중환자실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한 간호사 A씨의 고백이다. 그는 인력 한계상 의지만으로 대처하기 힘든 사고가 빈번한 의료 현장 실태를 낱낱이 밝혔다. 의료진은 부족한데 환자는 몰리는 바람에 투약 실수나 부실한 감염관리, 치료 소홀 등이 다반사라고 한다.
몇해 전 어느 날, A씨가 일하는 병동에서 하마터면 대형사고가 날 뻔했다. 이곳 간호사들은 평소에 인공호흡기와 투석기 등 온갖 장치가 달린 중환자를 각자 3명가량 돌본다. 실시간으로 환자 혈압, 호흡, 체온 등을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약물·주사제 투여, 대소변 기저귀 교체, 자세 변경 등을 해준다.
그날 밤은 응급상황이 생기지 않아 야간 근무조들이 평소와 같이 간호하고 있었다. 팔이 썩을 지경의 욕창이 생겨도 말없이 누워 지내는 중환자들의 자세를 정해진 시간에 따라 바꿔줬다. 이때에는 간호사 2명이 힘을 합쳐야 한다. 혼자 성인 중환자의 몸을 180도 뒤집는 건 불가능하다. 또 환자 몸에 주렁주렁 달린 생명 장치가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각자 환자를 3명씩 맡고 있는 간호사 2명이 이 일을 하는 사이 다른 중환자 5명은 사실상 방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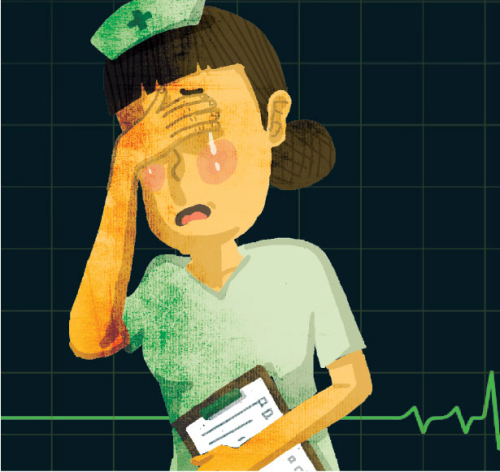
다른 방에 있던 환자가 얼굴을 움직이다가 인공호흡기가 빠져버린 것이다. 비상상황을 알리는 경고음이 울렸지만 각각 격리된 중환자실 벽들에 가로막혀 간호사들 귀까지 닿지 않았다.
낮에는 모든 방의 기계 알람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간호사’가 있다. 하지만 근무자가 적은 밤에는 공백이 불가피하다. 끝내 환자 심장이 멈췄고 방 밖에 있는 ‘생명 경고’ 알람까지 쩌렁쩌렁 울렸다. 그제야 간호사들이 이를 알아챘다.
A씨는 “심장이 한 번 멈췄다는 것만으로도 중환자에게 큰 부담을 준 것”이라며 “간호사가 1명만 더 있었더라도 벌어지지 않았을 의료사고”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치료와 살인의 경계에서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스템적으로 살인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며 “병원 인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피해는 환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통탄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고개 숙인 백종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6/128/20250506511791.jpg
)
![[데스크의 눈] 문화재 보존의 이유 일깨운 ‘사유의 방’](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3/18/128/20250318518938.jpg
)
![[오늘의시선] 대선공약에 일그러진 노동개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6/128/20250506511655.jpg
)
![[안보윤의어느날] 여백을 읽는 시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6/128/20250506511723.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