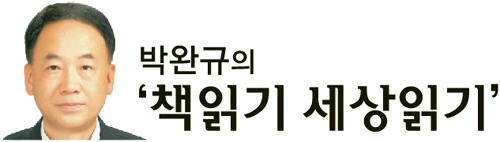
중국 작가 루쉰(魯迅)이 1920년대 초반에 발표한 소설 ‘아Q정전(阿Q正傳)’에서 주인공 아Q를 묘사한 대목이다. 루쉰은 우매하고 무지한 아Q를 통해 현실을 외면하고 자기만족에 빠져 있는 중국인의 모습을 그려냈다. 중국인들에게 각성을 촉구한 것이다.
아Q는 가난했다. “아Q는 집이 없어 웨이좡의 마을 사당에서 살았다. 일정한 직업도 없어 날품을 팔며 생활을 했다.” 하지만 터무니없이 자존심만 강했다. “웨이좡 사람 누구도 그의 눈에 차는 자가 없었다.” 그 자존심을 엉뚱하게 드러내곤 했다.
“그는 자기야말로 자기를 경멸할 수 있는 제일인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기 경멸’이란 말을 제외하면 남는 건 ‘제일인자’였다.” 그는 건달에게 두들겨 맞고는 잠시 서서 생각한다. “‘아들놈한테 맞은 걸로 치지 뭐. 요즘 세상은 돼먹지가 않았어…’ 그러고는 그도 흡족해하며 승리의 발걸음을 옮겼다.” ‘일종의 정신승리법’이라는 것이다.
“그래도 그는 이내 패배를 승리로 전환시켰다. 그는 오른손을 들어 두세 번 자기 뺨을 힘껏 때렸다. 제법 얼얼하니 통증이 왔다. 그러고 나니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다. 마치 자기가 때리고 다른 자기가 맞은 듯했다. 이윽고 자기가 남을 때린 것처럼 - 아직 얼얼했지만 - 흡족해져 의기양양한 기분으로 드러누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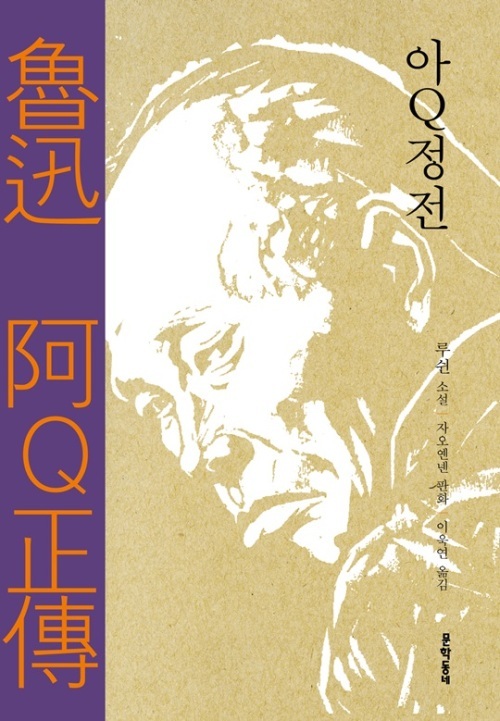
이러한 아Q에게서 근대로 접어드는 시기의 중국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루쉰은 이렇게 비꼬면서 말한다.
“우리의 아Q는 그런 약골이 아니었다. 그는 영원히 의기양양했다. 어쩌면 이 역시 중국의 정신문명이 전 지구상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증거 중 하나인지도 모른다.”
“아Q는 원래 바른 사람이었다. 어떤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남녀유별’에 관해서는 지금껏 매우 엄격했고 이단 - 이를테면 비구니나 가짜 양놈 따위 - 을 배척하는 기개도 있었다.”
루쉰은 나아가 혁명의 문제를 다룬다. 1911년에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세운 신해혁명이 하나의 사건으로 등장한다.
아Q는 혁명당원이 참수당하는 장면을 목격한다. “그런데 어디서 비롯된 생각인지 몰라도 그에게 혁명당은 반란을 일삼는 무리들이며 반란이란 곧 고난이었다. 그래서 줄곧 이를 ‘통절히 증오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혁명당에 벌벌 떠는 것을 보고 신명이 났고, 급기야 혁명당에 가입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혁명당에 가입하지도 못한 채 도둑으로 몰려 처형된다.
아Q의 처형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여론으로 말하자면, 웨이좡에선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모두들 아Q가 나빴다는 거였다. 총살을 당한 것이 그가 나쁜 증거라는 것이었다. … 그러나 도시의 여론은 그다지 좋지 못했다. 그들 대다수가 불만이었다. 총살은 싹둑 하는 것만큼 좋은 구경거리가 못 된다는 거였다. 게다가 그 웃기는 사형수라니, 그리 오래도록 끌려다녔건만 노래 한 구절 뽑지도 못하다니… 괜히 헛걸음질만 시켰다는 것이 그 요지였다.”
아Q는 허위의식으로 가득차 자만하면서도 비겁하기만 해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할 때조차 저항할 줄 몰랐고, 사람들에게 일말의 동정도 받지 못했다. 루쉰은 아Q를 통해 당대 중국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추려 했다. 하지만 시간을 초월한다. 중국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
| 중국 작가 루쉰(魯迅). |
종교학자 정진홍은 ‘고전, 끝나지 않는 울림’에서 ‘아Q정전’을 읽은 뒤의 감동에 대해 “‘이 이야기는 지금 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공감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해야 옳다”고 했다. “극도로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그것을 꿀꺽거리며 삼켜야 했던 세월들, 돈을 경멸하면서도 그것이 아쉬워 안달한 나날들, 채워지지 않는 자존심을 위해 내가 설정한 허다한 ‘못난 놈’들, 그리고 오가는 기회 앞에 서면 끊임없이 흔들리는 머뭇거림” 등이 그렇다는 것이다.
6·25전쟁 등 격동의 현대사를 살아온 세대여서 공감의 강도가 높았을 것이다. “그 전장의 소용돌이에서, 그것도 영토 뺏기 전쟁이 아닌 전장, 곧 ‘혁명’으로 설명되어야 하는 이념이 각축하는 전장에서 겪은” 단 한 가지가 “무수한 아Q 만들기, 무수한 아Q 죽이기”였다는 회고가 이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내가 바로 아Q”라는 그의 말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어떤 면에서는 루쉰이 묘사한 아Q다. 그러므로 ‘아Q정전’은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야기다. 지금도 널리 읽히는 이유일 것이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고개 숙인 백종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6/128/20250506511791.jpg
)
![[데스크의 눈] 문화재 보존의 이유 일깨운 ‘사유의 방’](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3/18/128/20250318518938.jpg
)
![[오늘의시선] 대선공약에 일그러진 노동개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6/128/20250506511655.jpg
)
![[안보윤의어느날] 여백을 읽는 시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6/128/20250506511723.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