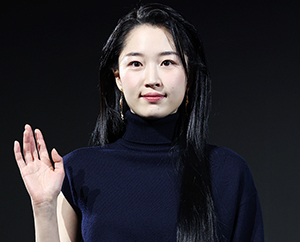“어허 벌써 올해도 마지막 달로 접어들고 있네.” 이런 탄식이 곧 올 한해의 마지막 달을 맞는 사람의 입에서 줄을 잇는다. 11월은 가을에서 겨울로 변하는 환절기이지만 계절과 계절 사이의 ‘간절기’이며 거창하게 시작한 우리의 일 년이 또 덧없이 지나갔음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쓰라린 때이기도 하다. ‘11월엔 생이 마구 가렵다’고 황지우 시인이 말했는데 우리 누구도 가렵지 않을 리가 없다.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은 아이의 손처럼, 이별을 앞둔 연인의 맞잡은 두 손처럼, 그렇게 깊고 짙어지던 가을이 어느 순간 우리 손을 탁 놓아버릴 것 같은 불안감 때문이리라. 사람들은 오는 겨울을 견디기 위해 마음의 빗장을 서두른다. 그러나 견뎌야 할 것은 계절만은 아닌 것이, 불황이네 불경기이네 하면서도 오르는 물가에다 우리나라의 간판 기업의 좌절이나 몰락, 거기다가 풀릴 줄 모르는 정치적 혼돈으로 우리 마음의 추위가 더 무서워지는 것이다.
 |
| 이동식 언론인·역사저술가 |
그렇지만 소설 ‘마지막 잎새’는 절망의 상징이 아니라 희망이자 생명이었다. 소녀를 위해 몰아치는 비바람을 뚫고 밤새 담장 위에 떨어지지 않는 푸른 잎을 그려놓고 세상을 떠난 늙은 화가가 있었던 것이다. 그 푸른 잎을 보며 소녀가 희망을 되찾고 다시 살아나지 않았던가? 그러기에 몇 년 전에 중국 지린성 창춘(長春)시에서는 뇌종양 말기의 한 소녀를 위해 병원 관계자들이 마치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양 연극을 해서 소원을 풀어준 사건이 ‘중국판 마지막 잎새’라는 제목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나무에서 잎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마지막이나 종결로 보는 것은 서양의 직선적 우주관에 의한 일방적인 관점일 수 있다. 동양의 순환적인 우주관은 나뭇잎이 떨어진다고 세상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양식으로 생각하면 봄은 탄생이고 여름은 성장이고 가을은 결실이고 겨울은 소멸이지만, 동양식으로는 봄부터 가을까지가 탄생과 성장과 결실인 것은 같지만 겨울은 소멸이 아니라 또 다른 봄의 탄생을 위한 저장과 비축인 것이다. 유명한 천자문(千字文)의 앞부분처럼 추위가 왔다 가면 더위가 오며(寒來暑往), 가을엔 거두고 겨울엔 갈무린다(秋收冬藏). 그러기에 늦가을에 떨어지는 마지막 잎새는 그것이 생명의 끝이 아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다른 생명이 잉태된다. 그 생명들이 다시 태어나서 우리와 세상을 즐겁게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준비를 위해 이 낙엽은 얼마나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간절기의 낙엽은 슬픈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쁨을 위한 준비이자 자기 완결이다. 오직 절망만이 있는 것 같은 눈앞의 정치현실에 대해서도 그것을 보는 눈, 보는 마음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다. 모든 권력에 4년이건 5년이건 주기를 둔 것도 바로 그런 뜻이리라. 우주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그 겨울이란 것이 끝이 아니라 봄의 새로운 탄생을 위한 ‘위대한 포기’이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라는 것, 그래서 나뭇잎이 떨어져 아무것도 남지 않는 듯한 이 계절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나라 곳곳에서 드러나는 수많은 부정과 부패, 권력형 비리 현상 등 부패하고 썩은 것을 보면서도 안심할 수 있다. 썩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은 아직도 썩은 것을 도려낼 수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새벽과 봄날은 꼭 와야 하고, 또 올 것임을 우리는 믿고 있다. 이즈음 우리 주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나목(裸木)들은 자신의 옷을 스스로 벗어버리며 자연과 우주의 깊은 뜻을 가르쳐주는 선생이 아니겠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버리는 것을 아는 것이다. 권력도 돈도 명성도 때가 되면 버릴 때에 영원히 자기 것이 되고 자신도 살 수 있음을 아는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잎새가 가르쳐 주는, ‘세상에 남겨진 이 우주의 자비’일 것이다.
이동식 언론인·역사저술가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한국 부자의 기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4/128/20251214508711.jpg
)
![[특파원리포트] 中 공룡 유통사들 유럽 공습](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4/128/20251214508707.jpg
)
![[김정식칼럼] 토지거래허가제의 득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4/128/20251214508692.jpg
)
![[심호섭의전쟁이야기] 북베트남은 어떻게 승리했을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4/128/2025121450869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