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선한 정국 옛 역사 다시 보는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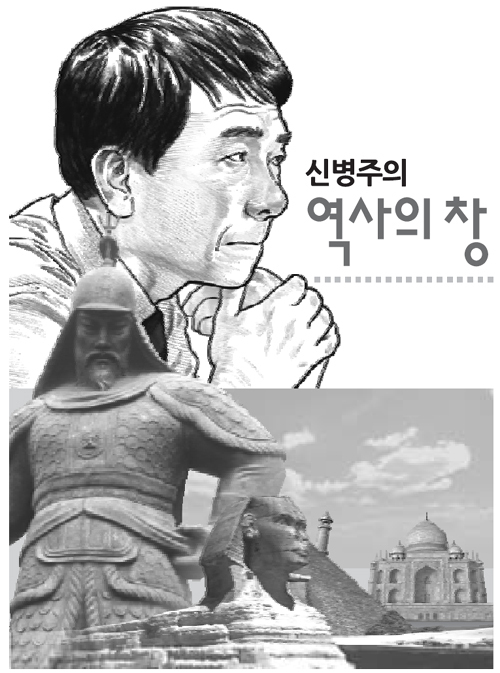
장녹수는 연산군의 음탕한 삶과 비뚤어진 욕망을 부추기며 자신의 욕망을 채워 나갔다. 연산군을 어린아이나 노예같이 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도 했다. “남모르는 교사(巧詐)와 요사스러운 아양은 견줄 사람이 없으므로, 왕이 혹하여 상으로 주는 돈이 거만(鉅萬)이었다. 부고(府庫)의 재물을 기울여 모두 그 집으로 보냈고, 금은주옥(金銀珠玉)을 다 주어 그 마음을 기쁘게 해서, 노비·전답·가옥도 이루 다 셀 수가 없었다. 왕을 조롱하기를 마치 어린아이같이 했고, 왕에게 욕하기를 마치 노예처럼 했다. 상 주고 벌 주는 일이 모두 그의 입에 달렸다”고 한 기록은 그녀의 위세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연산군이 장녹수에게 빠져 날로 방탕이 심해지자 할머니인 소혜왕후까지 나서 이를 나무랐지만, 연산군과 장녹수의 파행은 그치지 않았다. 장녹수는 궁 밖에 있는 사가(私家)를 재건하기 위해 민가를 헐어 버렸으며, 옥지화라는 기생은 장녹수의 치마를 한 번 잘못 밟았다가 참형을 당했다. 장녹수의 위세를 믿고 그 하인들마저 행패를 부렸으며, 모두가 출세하기 위해 장녹수 앞에 줄을 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무뢰한 무리들이 장녹수에게 다투어 붙어 족친이라고 하는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는 표현에서도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중종반정이 일어나기 10일 전인 1506년(연산군 12년) 8월 23일, 연산군은 후원에서 나인들과 잔치를 하다 시 한 수를 읊다가 갑자기 눈물을 두어 줄 흘렸다. 다른 여인들은 몰래 서로 비웃었으나 장녹수는 슬피 흐느끼며 눈물을 머금었다. 연산군은 장녹수의 등을 어루만지며 “지금 태평한 지 오래이니 어찌 불의에 변이 있겠느냐마는, 만약 변고가 있게 되면 너는 반드시 면하지 못하리라” 하였다. 두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예견이라도 했던 것일까.
결국 1506년 9월 2일 연산군 독재에 저항하는 중종반정이 일어났고 연산군은 폐위됐다. 장녹수는 반정군사들에게 붙잡혀 군기시(軍器寺) 앞에서 참형을 당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시체에 기왓장과 돌멩이를 던지며 “일국의 고혈이 여기에서 탕진됐다”고 하며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이후에도 장녹수가 국정을 농단한 사례를 경계로 삼을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실록 기록이 등장하고 있는 것도 주목되는 점이다.
요즘 정국이 워낙 혼탁하고 어수선해서인지 연산군과 장녹수의 최후가 단지 과거 역사 속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신병주 건국대 교수·사학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프랜차이즈 갑질’ 제동](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9/24/128/20250924519600.jpg
)
![[세계포럼] 건강보험 재정 누수, 이대로 둘 건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7/128/20250507521441.jpg
)
![[세계타워] 부동산과 개딸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6/18/128/20250618518838.jpg
)
![[오철호의플랫폼정부] 편리함 뒤의 불안, 정부가 답해야 할 때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9/24/128/20250924520399.jpg
)







![[포토] 고윤정 '반가운 손인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8/300/20250918519178.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