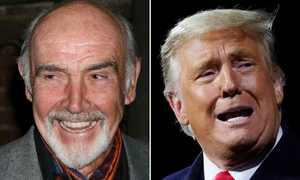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실리콘 태양전지에 비해 저가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높은 광 흡수율과 큰 전하 확산계수, 우수한 전하 이동능력 등으로 인해 발전효율이 높아 차세대 태양전지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활성층에 적용해 대기 중에서 정공 수송층이 없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제조한 결과 페로브스카이트 물질만 활성층으로 사용한 경우보다 광전류 밀도가 이론값의 97%까지 증가하고, 발전효율이 2배 이상 커졌다. 정공수송층은 태양광에 의해 광흡수층의 엑시톤(exiton)이 전하와 정공으로 분리돼 생성된 정공이 전극 쪽으로 원활하게 이동해 전류를 생성해주는 층을 말한다.
또 대기 중에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만들어도 공기 안정성이 매우 우수해 60일 이상 경과하더라도 소자수명이 90% 이상 유지되는 성과를 얻었다. 이는 페로브스카이트·산화니켈 나노복합소재의 화학적 안정성과 우수한 광전류 밀도 때문이라고 연구진은 밝혔다.
그동안 프린팅 기술로 저가 대량생산이 가능한 유기태양전지는 유기물질의 낮은 전도도와 화학적 불안정성 때문에 공기 중에 노출되면 소자 구조가 깨지면서 발전이 안 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한 교수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이크로 전자렌지를 이용, 짧은 시간에 전기전도도와 화학적 안정성이 우수한 그래핀(graphene)·은(Ag) 나노복합소재를 제조했다. 이를 유기태양전지의 활성층에 사용해 광전류 밀도와 공기 안성성이 우수한 태양전지를 제조할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전략연구)과 BK21플러스 사업 지원으로 이뤄진 이번 연구 결과는 에너지 분야 세계적 학술지인 나노 에너지(Nano Energy) 9월호와 10월호(온라인판)에 잇따라 게재됐다.
한윤봉 교수는 “차세대 태양전지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와 유기태양전지의 실용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단점들을 개선한 성과를 올렸다”며 “이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성능 좋은 태양전지를 상용화 하는 데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코리아 글로우 업](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31/128/20250731520509.jpg
)
![[기자가만난세상] 초고령사회 ‘국가 주도 돌봄’ 시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31/128/20250731520454.jpg
)
![[세계와우리] 안보의 본질은 자강(自强)](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31/128/20250731520499.jpg
)
![[기후의 미래] 플라스틱 협약과 만장일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31/128/2025073152046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