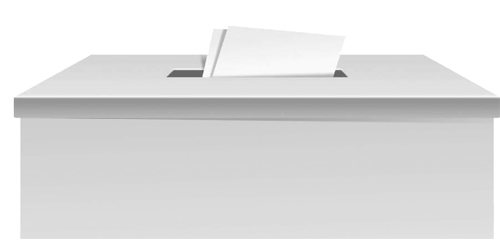
교육감 선출제도는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실시됐다. 이전에는 교육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다. 선출직 도입 초기에는 간선제 방식으로 교육감을 뽑았다. 교육위원회 위원 가운데 과반수 득표를 얻은 후보가 교육감 자리에 올랐다. 1997년부터는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단의 투표로 교육감을 선정했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비리 의혹, 부정선거 문제가 발생했다. 교육감 후보에 대한 검증장치가 없다는 등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교육감 직선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회는 2006년 12월7일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1년 반 이상의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교육자치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교육 주체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는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되, 공직선거법상 시도지사 선거의 무소속 후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연임 가능 횟수도 3회로 늘렸다.
이듬해인 2007년 2월 부산에서 처음으로 직선제가 실시됐다. 이어 2008년 서울·충남·전북, 2009년 경기 지역에서 직선제가 시행됐고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이 직선제로 동시 선출됐다.
그러나 직선제 하에서도 부정선거는 계속됐다. 직선제 도입 이후 선출된 서울시 교육감 4명 전원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법정에 섰다. 2008년 공정택 교육감이 부인 재산 신고 누락 혐의로 물러났고 2010년 곽노현 교육감은 후보 매수 혐의로 중도 사퇴했다. 2014년 문용린 교육감은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비리 ‘복마전’, 지역주민의 무관심에 따른 ‘로또선거’ 등과 같은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진보와 보수 교육감으로 나뉘어 정당 지원을 받는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교육계가 정치판으로 변질됐다는 문제 제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4/128/20251224514544.jpg
)
![[세계포럼] 금융지주 ‘깜깜이’ 연임 해소하려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4/128/20251224514519.jpg
)
![[세계타워] 속도 전쟁의 시대, 한국만 시계를 본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4/128/20251224514427.jpg
)
![[한국에살며] ‘지도원’ 없이 살아가는 중국인 유학생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4/128/20251224514493.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