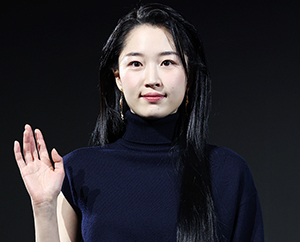하늘 무너지고 땅 꺼질까봐 걱정했다는 중국 기나라 사람의 ‘괜한 걱정’ 기우(杞憂)의 근심의 대상은 실은 이런 충격의 표현으로 오래전부터 쓰여져 왔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통용됐던 것은 아니다.
임금의 죽음만을 이르는 표현이었다. ‘천붕’이 그것이다. 임금의 죽음은 말로 표현하기조차 피해야 하는, 휘(諱)의 대상이었다. 휘는 꺼리거나 피한다는 말이다. ‘죽었다’, ‘돌아가셨다’는 직접적인 말 대신 천붕이라는 암시의 언어로 말해야 했다.
 |
| 종묘 정전에서 종묘제례가 열려 제관들이 제례를 지내고 있다.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비를 모시는 제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종묘대제’라고도 부른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오늘의 소사’와 같은 언론매체 등의 기록을 보면 ‘승하(昇遐)’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왕의 죽음은 ‘사(死)’ 혹은 ‘몰(歿)’, ‘망(亡)’ 등의 직설적인 말로 표현하지 않았다. 천붕처럼, ‘머나먼 곳[하(遐)]에 오르시다[승(昇)]’라는 승하 등의 은은한 뜻으로 ‘그 크디큰 슬픔’을 묘사했다.
 |
|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신주(神主)를 모신, 왕가의 사당(祠堂)인 종묘(宗廟)의 정전(正殿). 당대 지배 이념이었던 유교의 원리와 예법을 따라 지어지고 운영됐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어원이나 글자의 구성을 보면, 이 薨자는 임금이나 이에 준하는 이들의 죽음을 나타내기 위해 일부러 만든 말이라는 느낌이 든다. 어두울 몽(?)자의 생략형과 죽을 死자를 합쳤다. 사람의 눈(과 의식)이 흐려져서 이윽고 죽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제후(諸侯)나 왕공(王公)의 죽음을 이른다는 해설이 한자사전의 풀이다.
‘붕어(崩御)’는 천붕과도 같은 이미지다. ‘어(御)’는, 영어의 로열(royal)처럼 임금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말이다. 사극에서 듣는 ‘어명이요!’의 ‘어’다. 어명은 임금의 명령이다.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에서 보이는 ‘어’와 같다.
임금[御]의 하늘[天]로 용이 날아가는[비(飛)] 것을 표현한 시가(詩歌)가 용비어천가다. 용 또한 임금을 상징하는 상상의 동물이니 그 제목이 갖는 상징성의 무게는 대단하다. 훈민정음을 만든 세종대왕이 그 글자를 이용해 자기 선조들의 공덕을 칭송하도록 신하들에게 짓게 한 노래다. 권력에 아부하는 글을 용비어천가로 빗대어 말하는 경우도 있다.
 |
| 중국 은(殷)나라 때의 갑골문.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를 신에게 묻고 그 대답(점괘)를 기록했다. |
‘승하(升遐)’, ‘등하(登遐)’는 ‘승하(昇遐)’와 비슷한 뜻이다. 예의(禮儀)의 예와 오른다는 말 척(陟)자를 합친 예척(禮陟)도 ‘왕의 죽음’이란 의미다. 척방(陟方)도 비슷하다.
제사나 조상이라는 뜻 품은 차(且)자와 알(歹)자를 합친 조(殂)자도 임금의 죽음을 나타내는 글자다. 특히 떨어질 낙(落·락)자와 합쳐 조락(?落)이 되면 임금 전용 이미지가 된다.
임금의 상징인 용과, 말[마(馬)]을 몬다는 뜻 어(馭)자를 합친 말 용어(龍馭)나 ‘편안하게[안(晏)] 가마에 오르다’는 뜻의 ‘안가(晏駕)’도 같은 뜻이다. 련(輦)이나 교(轎)와 같은 가마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단어 대신 ‘임금의 수레’라는 가(駕)자를 쓰는 것도 특별하다.
참 다양하다. 가히 비유의 극치라고 하겠다. 낯설지만 거의 과거사의 여러 사료(史料)에 적힌 말들이다. 연속극에도 간혹 나온다. 임금의 죽음과 그에 따른 장례는 그렇게 은유(隱喩)의 바다였다.
임금이 세상을 다스릴 때 이런 ‘용어’를 함부로 쓰는 일은 ‘휘(諱)’를 거스르는 것으로 괘씸죄(?)의 대상이었으리라. ‘언어의 정치학’의 한 모습이다. 문자(文字)의 조락(凋落)과 함께 이런 말의 여러 뜻들도 함께 사위어간다. 조락은 낙엽 지듯 시들어 떨어지는 것이다.
강상헌 평론가·우리글진흥원장 kangshbada@naver.com
■ 사족(蛇足)
죽을 사(死)자의 역사는 길다. 동아시아의 첫 글자인 갑골문(甲骨文)의 글자 무더기에서부터 등장한다. 3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서진 뼈 또는 살이 떨어져 나간 뼈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이 死자의 첫 글자다.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그려진 그림이다.
한 장면이지만 두 개의 이미지로 나눌 수 있다. 죽은 자의 부서진 뼈 그림은 알(?)자가 됐다. 이 ?자는 사(死)에서처럼 죽음과 관련이 있는 수많은 말을 만드는 부품이다. 몰(歿), 빈(殯), 조(?) 말고도 따라 죽을 순(殉), 죽을 운(殞), 재앙 앙(殃), 해칠 잔(殘), 위태할 태(殆) 등의 글자가 만들어졌다.
갑골문(甲骨文)은 거북의 껍질[甲]이나 소와 같은 동물의 넓적한 뼈[骨]에 칼로 흠집을 내고 그 자리를 불로 지져 생겨난 균열을 보고 점을 친 흔적이다. 신(神)에게 묻고, 신에게서 받은 대답[점괘(占卦)]을 흠집과 균열 옆에 기록했다. 그것이 갑골문이다. 그 기록의 기호가 그림을 토대로 한 상형문자(象形文字)다.
허리 굽혀 죽은 자를 바라보는 사람 모습의 그림은 인(人)자의 갑골문과 개념이 같다. 사람이 손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절하는 듯한 모습을 옆에서 본 그림이 사람 人자의 첫 (그림)글자다. 그 그림이 人자가 되기도 하고, 死자에서처럼 간략한 기호로 변하기도 하는 것으로 문자학은 추정한다.
죽을 사(死)자의 역사는 길다. 동아시아의 첫 글자인 갑골문(甲骨文)의 글자 무더기에서부터 등장한다. 3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서진 뼈 또는 살이 떨어져 나간 뼈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이 死자의 첫 글자다.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그려진 그림이다.
 |
| 죽을 사(死)자의 개념도. 왼쪽이 산 사람, 오른쪽이 죽은 사람의 뼈 그림이다. |
갑골문(甲骨文)은 거북의 껍질[甲]이나 소와 같은 동물의 넓적한 뼈[骨]에 칼로 흠집을 내고 그 자리를 불로 지져 생겨난 균열을 보고 점을 친 흔적이다. 신(神)에게 묻고, 신에게서 받은 대답[점괘(占卦)]을 흠집과 균열 옆에 기록했다. 그것이 갑골문이다. 그 기록의 기호가 그림을 토대로 한 상형문자(象形文字)다.
허리 굽혀 죽은 자를 바라보는 사람 모습의 그림은 인(人)자의 갑골문과 개념이 같다. 사람이 손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절하는 듯한 모습을 옆에서 본 그림이 사람 人자의 첫 (그림)글자다. 그 그림이 人자가 되기도 하고, 死자에서처럼 간략한 기호로 변하기도 하는 것으로 문자학은 추정한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치매 머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5/128/20251215517423.JPG
)
![[주춘렬 칼럼] ‘AI 3대·반도체 2대 강국’의 현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0/128/20251020518406.jpg
)
![‘주사 이모’가 사람 잡아요 [서아람의 변호사 외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3/128/20251103514866.jpg
)
![[박소란의시읽는마음] 어제와 비에 대한 인터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5/128/202512155174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