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가쁜 일상에 더 나은 삶 위해 모여 “도시에서 일할 때는 스트레스 때문에 1년 내내 휴가만 기다렸죠. 지금은 여기서 사는 것 자체가 매일 매일 휴가이자 축제예요.”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좋아서 공동체 삶을 연구하는 ‘평화연구소’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율리안 겝켄(28). 그가 선택해 사는 곳은 독일 하노버 인근 소도시 슈타이어베르크에 자리 잡은 ‘레벤스가르텐(Lebensgarten·삶의 정원)’이다. 이곳에는 이처럼 사람 냄새 나는 전원 속 유토피아를 꿈꾸는 120여명, 60여가구가 모여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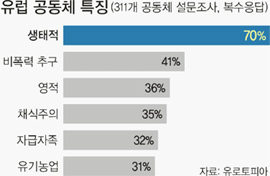
레벤스가르텐의 하루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시작된다. 오전 7시, 마을회관 앞 공터에 모인 주민들은 이국의 민속음악을 틀어놓은 채 손을 맞잡고 스텝을 밟으며 마치 ‘강강술래’처럼 빙글빙글 돌았다. 수없이 재생해서 낡은 카세트테이프를 고르던 데클란 케네디(80)는 “전 세계에서 모은 음악”이라며 “단순한 동작이지만 운동도 되고, 함께 손을 잡으며 모두 이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침 식사에 초대받아 크리스티네 박스(63·여)의 집에 가자 마을 사람 몇 명이 각자 직접 만든 빵과 잼 등을 꺼내놓았다. 아침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대도시에서 비서일을 하다가 사람의 정이 그리워 이곳에 정착했다는 박스는 “대가족과 함께 사는 것 같다”고 했다.
 |
| 레벤스가르텐 마을 어린이와 교사들이 마을과 연결된 숲 속에 조성된 ‘숲 유치원’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
레벤스가르텐의 생활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통로인 여러 세미나 프로그램은 제법 인기가 높다. 독일 전역은 물론 외국에서도 찾아올 정도다. 이해와 중재, 명상을 통한 영적 깨달음, 자연과 어우러진 생활에 대한 내용이다. 세미나 수입은 마을의 운영경비로 사용된다.
 |
| 레벤스가르텐 마을회관 내 유기농 식품점. 각자 필요한 물건을 가져간 뒤 장부에 기록하고 나중에 정산하도록 돼있다. |
레벤스가르텐은 1985년 나치의 무기공장 부지에서 태어났다. 당시 땅을 사들인 사업가 크리스티안 벤진 등은 공장노동자가 살던 열악한 1930년대식 주택을 쉽게 철거해버리는 대신 리모델링을 통해 고풍스러운 주택단지로 재탄생시켰다. 척박한 황무지에서는 이제 농산물이 풍성하게 자라고 있다. 버려진 죽음의 땅이 에너지가 넘치는 생명의 땅으로 바뀐 것이다.
당시 서독은 전후 상처를 딛고 유럽 최고의 공업국가로서 풍요로운 시절을 누리고 있었다. 교수, 변호사 등 경제적으로 부족함은 없지만 바쁘게 살던 도시인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레벤스가르텐으로 모여들었다. 레벤스가르텐 창립에 참여한 교수 부부 데클란·마그릿 케네디는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삶을 변화시키고 싶었다”고 회상했다. 당시 이러한 생활 방식은 파격적인 것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이후 독일에 비슷한 공동체가 많이 생겨났다.
레벤스가르텐이 다른 공동체와 다른 건 규율과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벤진은 “평화, 관용, 창조성이 레벤스가르텐의 핵심 가치이며 그외에 규칙이나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설명했다.
 |
| 레벤스가르텐 마을 사람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음식을 덜고 있다. |
레벤스가르텐의 정신은 이제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 3년 전 레벤스가르텐에 정착한 통역가이자 음악가인 마리아 타케(32·여)는 “젊은 사람들이 살기에 따분한 곳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친구이며, 창조적 영감과 열정이 늘 살아있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30대 젊은 주민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앞으로 이런 좋은 정신을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슈타이어베르크=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트럼프와 파월의 악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3/128/20260113517780.jpg
)
![[데스크의 눈] 염치불고 시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3/128/20260113517775.jpg
)
![[오늘의 시선] 저성장 탈출구는 혁신에 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3/128/20260113517746.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돌 선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3/128/2026011351776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