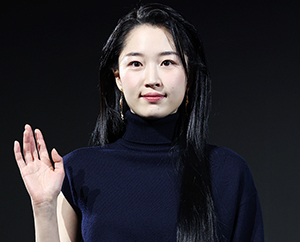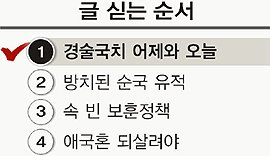 노인의 눈가에 주름이 파르르 떨렸다.
노인의 눈가에 주름이 파르르 떨렸다.
“그동안 집안 사람을 빼고 조부 얘기를 물어본 사람은 처음이네. 젊은 사람이 어찌 알고….”
김순동(82)씨는 조부 김택진(1874∼1910) 선생의 순국활동을 묻는 기자에게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경북 안동시내에서 차로 10여분 거리에 떨어진 풍산읍 소산리에서 농사를 지으며 평생을 살아온 그였다. 여느 시골마을처럼 집들이 그림처럼 늘어서 있고 큼지막한 저수지가 눈에 띄었다.
노인은 손을 들어 저수지를 가리켰다. “조부께서 살았던 생가가 잠겨 있는 곳이여.”
기억을 더듬던 노인은 “내가 여덟 살쯤 됐을 때야. 일본놈들이 저수지를 만든다고 집을 옮기라고 하더군. 그나마 조부 흔적이 남은 유일한 장소였는데…”라며 씁쓸해했다.
집으로 발걸음을 옮긴 김씨는 안동 김씨 족보를 꺼냈다. 김택진 선생의 간략한 행적이 적혀 있었다. ‘갑술년(1874년) 9월30일생(음력)… 경술(1910년) 한일합병 애국단식 10월27일 순사’
“조부의 과거시험 합격증 말고는 자료가 없어. 항일 행적도 족보 외에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 안타깝지….”
김씨가 사는 안동에는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까닭에 주위에서 누가 유공자로 지정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조부의 공덕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죄책감에 속내가 편치 않다.
 |
| ◇나라 망하자 자결한 김택진 선생 손자 김순동씨 |
다행히 이번 취재에서 김택진 선생의 행적은 여러 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1985년 발간된 ‘안동판독립사’에 선생의 애국활동이 실려 있고,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홈페이지에도 ‘지역의 독립운동가’로 이름이 올라 있다.
특히 안동판독립사는 1895년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을 당시 무장 항일투쟁을 전개했고, 1910년 나라가 망하자 “천만금이 생겨도 친일행위를 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단식에 들어가서 21일 만에 순국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선생의 행적을 들려주자 김씨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여든이 넘은 노구에 순국행적을 조사해 제출하라는 당국의 처사가 자꾸만 야속하게 느껴졌다.
“6·25 참전용사들만 훈장 혜택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전북 순창군 금과면 방성리에서 만난 공병학(76)씨는 고조부인 공치봉(1831∼1910) 선생의 행적을 묻는 취재진에게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고조부의 공적에 그동안 어느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
| ◇의병 활동 후 순국한 공치봉 선생 고손자 공병학씨 |
선생의 후손들은 공씨 집성촌인 이 마을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고손자인 공씨의 안내로 마을 입구에 있는 선생의 묘소를 찾았다. 40여년 전 문중에서 세운 묘비에는 ‘의사(義士)’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정부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훈장 서훈이 가능했을 것이란 아쉬움이 뇌리를 스쳤다.
공씨는 훈장 서훈 신청을 하지 않은 원인으로 정부의 홍보 부족을 꼽았다.
“시골에서 농사짓고 살다 보니 나라에서 독립유공자에게 훈장을 주는 것을 몰랐어요. 면사무소 등을 통해 알려줬으면 진즉에 서훈 신청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배우지 못한 자신의 처지에 한숨을 내쉬었다. 세상 일에 똑똑하지 못해 조상의 충절을 바로 모시지 못했다는 생각에서다.
자결이 있은 후 일본 경찰은 선생의 묘조차 쓰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후손들이 묘를 만들자 경찰서로 끌고가 유치장에 가뒀다. 일제의 탄압으로 집안살림도 말이 아니었다. 콩잎으로 죽을 쒀 겨우 연명을 할 정도였고 후손들은 학교조차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안타까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훈장 서훈이 늦어지는 바람에 선생과 관련된 기록들이 거의 소실되고 말았다. 후손들이 고이 간직해온 선생의 문집과 배첩 등은 지난해 집안의 화재로 불에 탔다.
 |
| ◇공치봉 선생의 항일행적 자료 |
“보훈연금은 바라지도 않아요. 독립유공자로 떳떳이 인정을 받아 제대로 된 비석 하나라도 세웠으면 합니다.”
선생이 떠난 지 100년, 순국의 충절을 되살리는 일이 한 후손의 개인적인 바람에만 그쳐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동취재팀=배연국 팀장, 이귀전·장원주 기자 strum@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치매 머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5/128/20251215517423.JPG
)
![[주춘렬 칼럼] ‘AI 3대·반도체 2대 강국’의 현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0/128/20251020518406.jpg
)
![‘주사 이모’가 사람 잡아요 [서아람의 변호사 외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3/128/20251103514866.jpg
)
![[박소란의시읽는마음] 어제와 비에 대한 인터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5/128/202512155174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