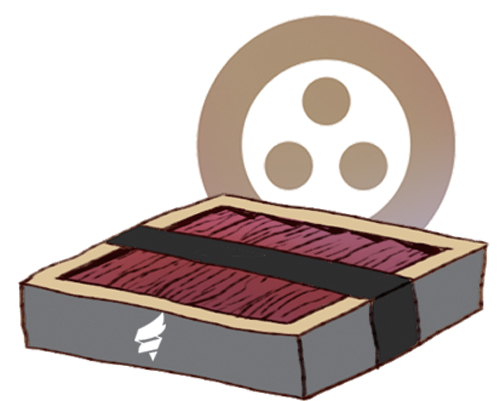
법화경. 불교 초기 경전 ‘삿다르마 푼다리카(올바른 가르침의 백련)’를 번역한 책이다. 대표적인 한문 번역본은 인도의 고승 구마라습의 ‘묘법연화경’이다. 줄여 법화경이라고 한다.
“세상 모든 것은 본질이 없고(空), 차별의 근거로 삼는 형상도 없으며(無相), 작위 없이 존재한다(無願). … 생기거나 사라지는 법도 없다(不生不滅).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라.”
법화경 ‘약초유품’에 나오는 말이다. 석가여래가 ‘소경의 비유’를 든 뒤 제자 가섭에게 한 말이다. 왕사성 영취산에 모인 수많은 아라한과 보살, 비구들. 그들을 향해 끝없이 이어지는 석가여래의 설법은 법화경을 빼곡히 채운다. 그런 까닭에 법화경은 보배와 같은 최고의 경전으로 꼽힌다.
육식을 금하는 불교의 계율.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 법화경에는 딱히 육식을 금하는 계율은 없다. 그것은 재가인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계율(五戒)에서 비롯된다. 불살생(不殺生). 오계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계율이다. ‘살아 있는 것은 죽이지 말라.’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위대한 자비’의 정신이 녹아 있다. 살생을 하지 않으려면 육식을 멀리 해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불교 승려가 육식을 하지 않는 걸까. ‘티베트의 스승’ 달라이 라마의 행적을 담은 책 ‘용서’. 그는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채식주의자로 살았다. 이따금 티베트에서 선물로 가져온 말린 야크 고기 외에는 거의 고기를 먹지 않는다.” 티베트 불교의 육식은 환경에 따른 산물이다.
자유한국당이 조계종을 대표하는 스님들에게 육포를 설 선물로 전해 곤욕을 치렀다. 원래 한과를 보내려던 것을 잘못 보냈다고 한다. 난감한 일이다.
심기가 언짢은 불교계를 달랠 방법은 없을까. 있다. 합장을 하면 된다. 콘스탄틴 게오르규의 소설 ‘25시’. 마지막 글은 이렇게 끝난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쿼바디스 도미네).” 게오르규는 신부다. 우리나라에 온 어느 날 산길에서 비구니 스님을 만났다. 스님은 성호를 긋고, 그는 합장을 했다. 무슨 뜻을 담은 행동일까. 포용의 정신이 번득인다. ‘포용이 빛처럼 쏟아지는 땅’. 종교도, 정치도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강호원 논설위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총선 민심이 백지수표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4/25/128/20240425520860.jpg
)
![[현장에선] OTT들의 구독료 배짱 인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3/14/128/20240314519728.jpg
)
![[오늘의시선] 산으로 가는 연금개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1/05/128/20230105519484.jpg
)
![[세계와우리] 한국의 안보 포트폴리오와 ARF](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2/15/128/2024021551955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