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향전’을 만드는 사람들
‘반도의 봄’(1941)의 오프닝은 현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식민지 시대 영화 중 가장 인상적이다. 다소곳이 앉아 가야금을 뜯고 있는 여인에게로 한 도령과 하인이 다가가고, 방 안에 들어선 도령이 “춘향아”라고 그녀를 부르면 관객은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익숙한 로맨스의 세계에 빠져들 준비를 한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숏은 춘향과 몽룡의 오붓한 만남이 실은 차가운 카메라와 조명 앞에서 촬영 중인 장면이라는 것을 갑작스럽게 보여준다. 이 전환은 폭력적으로 느껴질 정도인데, 아마도 감미로운 가야금 소리와 은은한 발에 에워싸인 달콤한 사적 공간이 고도의 계산 속에서 조작·제작되는 중이라는 충격 때문일 것이다. 대중적으로 가장 인기 있던 춘향의 사랑 이야기에 심취되려는 은밀한 순간을 방해당한 당혹감.
그런데 이 당혹감은 곧이어 들려오는 스태프의 대화가 일본어라는 사실 때문에 더 증폭된다. 조선인이 사랑하는 춘향과 몽룡의 만남을 연출하는 존재가 일본(인)이라는 타자였기 때문이다. 이 공간에는 19세기 사라진 왕조의 조선인들과 1941년의 일본인들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조선어는 허구적 시공간에서만 허용되고, 그것을 정밀하게 주조하는 기술자·예술가는 일본인이며, 1941년 당시를 살아가던 조선인은 삭제된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촬영되고 있는 영화 ‘춘향전’은 누구의, 누구를 위한 작품이었던 걸까.

◆‘조선 붐’과 엑조티시즘
사실 일본인에 의해 제작된 ‘춘향전’은 여럿 있었다. 최초의 상업용 극영화인 1923년의 ‘춘향전’은 조선에 이주한 일본인 하야카와 고슈(早川孤舟)가 만들었고 우선 일본인 관객들을 대상으로 공개됐다. 이때의 마케팅 포인트는 ‘춘향전’의 배경인 남원에서 로케이션 촬영을 했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기생을 춘향역으로 캐스팅했다는 것이었다. 일종의 다큐멘터리적 관광 영화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재일 조선인 작가 장혁주가 각색한 ‘춘향전’은 일본의 유명한 사회주의 연극인 무라야마 도모요시(村山知義)가 가부키식으로 만들어 1938년 무대에 올렸다. 중일전쟁 이후 병참기지가 된 조선에 대한 관심이 일본에서 증대되던 때였기 때문에 이 공연은 큰 화제를 낳았다. 조선에 와서 공연을 하기도 했는데, 이후 조선의 한 영화사에서는 무라야마 도모요시를 초빙해서 영화 ‘춘향전’을 제작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반도의 봄’의 원작 소설(‘반도의 예술가들’·半島の芸術家たち)을 쓴 재일 조선인 김성민은 이렇게 조선적인 것을 일본에 소개하고 판매하는 장혁주의 활동에서 영감을 얻었고, 감독 이병일은 원작에는 없던 ‘춘향전’을 삽입해 영화를 만들었다. 결국 ‘춘향전’이라는 고전 텍스트는 조선인들에게 인기 있는 작품이기도 했지만 일본에서 식민지 엑조티시즘을 충족시켜주는 문화상품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때 장혁주와 이병일처럼 그 상품화에 적극 참여한 식민지 지식인들의 역할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반도의 봄’의 오프닝 장면에서 영화를 찍은 스태프도 감독 등 다수가 조선인이었음이 곧 밝혀진다.
그래서 ‘반도의 봄’은 표면적으로는 어려운 환경에서 영화 제작에 헌신하는 영화인들의 분투기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일본이라는 타자의 시선을 경유해서 ‘조선적인 것’을 창출해내고 있는 조선 영화 자체에 대한 메타적 이야기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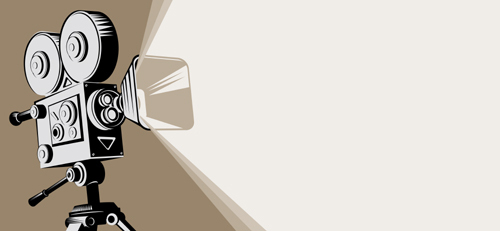
◆조선 영화에 대한 영화
‘반도의 봄’은 오랫동안 닛카쓰 감독부에 있던 신예 이병일을 감독으로 하여 명보영화사 제1회 작품으로 제작됐다. 조선영화령이 선포돼 영화 신체제가 작동되기 시작할 즈음이자 민간 영화사가 단 하나의 영화사(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로 통폐합돼 실질적으로 영화산업이 조선총독부의 통제 하에 놓이기 직전인 1941년 11월에 개봉했다. ‘춘향전’을 만드느라 고투하는 영화인들(주인공 영일 및 감독 허훈 등)과 그런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떠난 배우 안나, 그녀가 떠난 자리를 메꾸며 스타로 떠오르는 정희 등이 등장한다. 자금난으로 영화 제작이 중단되는 등 위기가 닥치는데, 구세주처럼 나타난 사업가 방창식이 반도영화사를 설립하며 “내선일체 원칙과 함께 황국신민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는 진정한 문화재인 훌륭한 영화를 만드는 것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중대한 책임이며 이 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라고 역설하는 장면이 삽입된다.
이 갑작스러운 반전은 1942년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가 설립될 것을 예표하는 듯해서 섬뜩하기까지 하다. 주먹구구식 제작 방식에서 벗어나 안정된 시스템 하에서 영화를 제작할 수 있게 돼 기뻐하는 영일과 달리 감독 허훈의 표정이 어둡게 그려져서, 아직도 많은 관객과 연구자들은 그 표정을 영화 통제에 대한 일종의 비순응 혹은 저항의 기호로 읽기도 한다. 개봉 당시에는 이 반전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힘든 대신 신선미가 없는 “통속적 멜로드라마”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감독의 연출과 카메라의 앵글과 화면 전환 등 기술적인 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얻었다.

◆이중 언어 상황
국내외 많은 연구자들의 흥미를 끌었던 것은 ‘반도의 봄’에서 조선어와 일본어 대사가 구현되는 맥락이다. 일본어 대사가 특정 상황에서만 사용됐던 당시 영화들과도 다르고, 조선어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이후 영화들과도 다르기 때문이다. ‘반도의 봄’에서 영화사 사장이나 레코드 회사 부장과 같은 사람들은 일본어를 주로 사용하고, 주인공 영일이나 영화감독은 비슷한 지식 혹은 지위를 소유한 사람들과는 일본어로 말하지만 조선인 여성 등 대중과는 조선어로 말한다. 즉 조선인의 일본어 구사는 사회문화적 자본의 소유 여부와 관련돼 있다.

그런데 그런 자본을 소유하지 않은 안나, 즉 도쿄에서 댄서를 했고 경성에서는 레코드사 한 부장과의 내연 관계를 끝내면서 술집에서 일하게 되는 안나는 시종일관 유창한 일본어만 말한다는 점에서 이질적이다. 혹자는 러시아 이름에 얼굴은 동양인인 안나를 무(無)국적적인 존재라 분석하기도 하는데, 어쩌면 안나는 조선인 남성들과 일본어로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즉 일본 여성으로 상정됐던 걸지도 모른다. 조선 배우 백란이 안나를 연기했기에 지금까지 안나를 일본인으로 간주할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반도의 봄’ 제작 소식을 전하는 기사들에는 백란은 언급되지 않는 대신 일본 영화계의 스타 시가 아키코(志賀曉子)를 초빙해 촬영 중이라는 내용이 있다. 어떤 이유에선지 그녀는 영화에 등장하지 않게 됐지만, 그녀가 맡았던 역할이 애초에 안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남주인공 영일은 일본 여성 및 조선 여성과 삼각관계 속에 놓이는 셈이 된다. 나아가 극중극 ‘춘향전’의 춘향 역이 일본 여성(안나)에서 조선 여성(정희)로 교체되는 흥미로운 진행이 예정됐던 셈이다.
계속 곱씹어 보게 되는 것은 연적이라 할 수 있는 안나와 정희가 일본어로 대화하는 장면이다. 정희의 병실에서 안나는 자신이 영일을 사랑할 자격이 없는 여자이고 영일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은 정희라고 말하며 작별을 고한다. 영화 내내 주로 조선어만을 말했던 정희는 이 순간만큼은 줄곧 일본어로 안나와 얘기하는데, 이때 일본어는 영화사 사장이나 영일에 이르기까지 식민지 남성들의 사회문화적 자본과는 무관하게 사적이고 진솔한 토로의 수단이 된다. 여성들끼리의 이 유일한 일본어 대화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효율적이어서, 영화 속 영화인 ‘춘향전’에서 구현되는 조선어를 매우 낡은 구식 언어로 보이게 만들 정도다.
백문임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4/128/20251224514544.jpg
)
![[세계포럼] 금융지주 ‘깜깜이’ 연임 해소하려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4/128/20251224514519.jpg
)
![[세계타워] 속도 전쟁의 시대, 한국만 시계를 본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4/128/20251224514427.jpg
)
![[한국에살며] ‘지도원’ 없이 살아가는 중국인 유학생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4/128/20251224514493.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