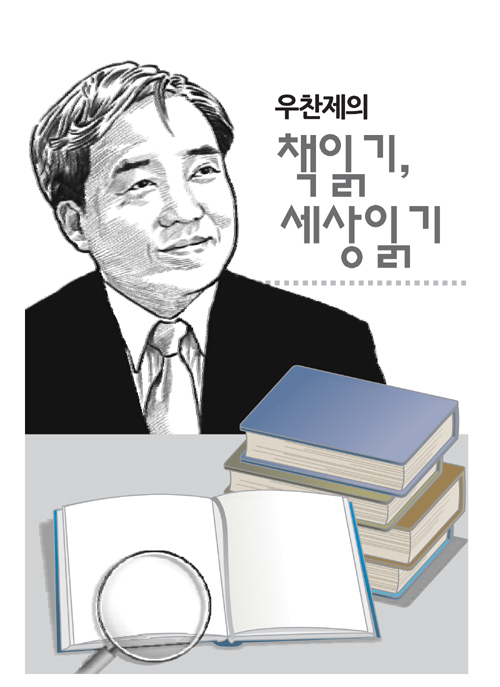
그러나 불행하게도 새 외투를 입고 출근한 첫날 밤 강탈당하고 만다. 외투를 찾아 달라고 하소연하지만 물거품이 되자 화병으로 죽게 된다. 그가 죽은 후 상트페테르부르크 밤거리에 귀신이 돼 외투만 벗겨간다는 소문이 떠돈다. 19세기 초반 러시아 하층민의 비애를 고골리는 억울한 유령이 될 수밖에 없었던 필경사 이야기에 담았다.
‘모비딕’으로 잘 알려진 미국 작가 허먼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의 주인공 역시 필경사였다. 미국 경제의 심장부로 얘기되는 월가가 형성되던 1853년 작품이다. 맨해튼에 마천루가 들어서고 주식과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던 무렵, ‘부동산 양도증서 작성 변호사이자 부동산 권리증서 추적자이자 온갖 종류의 난해한 서류 작성자의 업무’를 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필경사로 바틀비가 고용된다. ‘창백할 정도의 단정함, 애처로운 기품, 치유할 수 없는 고독’한 모습으로 나타난 바틀비는 첫 며칠 동안 엄청난 양의 필사를 한다. “마치 뭔가 필사할 것에 오랫동안 굶주린 사람처럼 그는 내 문서를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듯 했다. 소화를 위해 쉬지도 않았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면서 낮에는 햇빛으로 밤에는 촛불을 켜고 필사를 했다. (…) 그는 말없이, 창백하게, 기계적으로 필사를 계속했다.”
그러다가 변호사가 필사한 서류 검토 작업을 같이하자고 요청하자, “I would prefer not to” 라고 대답한다. 번역본에 따라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는 편이 낫겠어요” 등으로 옮겨진 이 대목이 문제적이다.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겠다는 자유의지의 단호한 표명이어서 범상치 않다. 법과 명령 체계, 그리고 돈의 흐름으로 운영되는 자본주의 체제 흐름을 중단시키는 어떤 계기가 매설돼 있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요구하고 명령하고 감시하는 체제에 대한 부정과 무위의 선택, 그것은 메인 스트림을 거스르며 비껴난 사잇길에서 새로운 생의 이면을 환기한다. 들뢰즈, 아감벤, 지제크 등 여러 철학자들이 바틀비를 주목한 것은 그러한 문제성 때문이다. 바틀비는 필사하는 일도, 공동으로 서류 검토하는 일도, 우체국에 다녀오는 일도, 다른 직업을 선택하라는 권유도 모두 거부하기에 이른다. 사무실을 떠나라는 것도 거부한다. 끝내 부랑자 구치소에 갇히게 된 그는 식사를 거부하면서 생을 마감한다.
과로사회 혹은 피로사회라는 말이 회자된다. 주당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과로가 줄어드는 분위기를 기대했지만 아직 쉽지 않은 것 같다. 아감벤이 이상적인 삶의 형상으로 본 순수한 삶, 즉 순수하기에 잠재성으로 충만한 삶은 아직 멀리 있는 느낌이다. 바틀비는 노동 과정에서 소진과 절망을 체험한 인물인지 모른다. 경쟁에 쫓기며 일을 하면 할수록 잠재성은 소진되고, 가능성은 거세되기 일쑤라면 행복의 지평은 어디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고 바틀비처럼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소설은 이렇게 끝난다. “아 바틀비여! 아, 인간이여!”
우찬제 서강대 교수·문학비평가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총선 민심이 백지수표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4/25/128/20240425520860.jpg
)
![[현장에선] OTT들의 구독료 배짱 인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3/14/128/20240314519728.jpg
)
![[오늘의시선] 산으로 가는 연금개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1/05/128/20230105519484.jpg
)
![[세계와우리] 한국의 안보 포트폴리오와 ARF](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2/15/128/2024021551955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