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의 사례는 한국의 신혼부부가 처한 환경을 잘 보여준다. 이들에게 차곡차곡 월급을 저축해 집을 마련하는 ‘주거 사다리’는 없다. 가구 확장과 주거 소요 변화 등에 따른 주거 상향 이동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요즘처럼 서울 강남권의 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자마자 4억, 5억원씩 공돈을 손에 쥐는 구조에서 집은 그저 돈을 버는 수단일 뿐, 사다리 역할은 아예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이런 현상이 워낙 오래, 광범위하게 벌어지다 보니 집이 없으면 이제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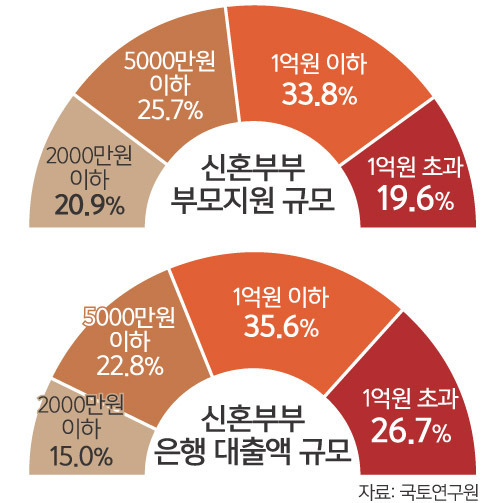
주거와 출산의 관계도 밀접하다. 자가로 변화한 경우 전월세로 남아있는 경우에 비해 현재 자녀 수와 계획 자녀 수가 많았다. 연구팀은 “신혼의 주거 안정성이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안정성 수준에 따라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인구 현상에서 신혼부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은 더욱 심각해진다. 2016년 기준으로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의 출산이 전체 출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3.8%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연구팀은 “신혼부부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 지원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임대료 상승 억제와 같은 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니 신혼부부 감소와 출산율 저하의 악순환이 이어진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한국의 신혼부부는 2013년 약 30만가구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았지만 2015년에는 29만가구로 줄었다. 혼인 건수는 1995년 43만5000건에서 2016년 28만2000건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출생아 수도 1995년 71만5000명에서 2016년 40만6000명으로 줄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전업자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1/128/20260111509892.jpg
)
![[특파원리포트] 21세기 ‘흑선’ 함대에 마주선 한·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1/128/20260111509858.jpg
)
![[박영준 칼럼] 美 국방전략 변화와 한·미 동맹 과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1/128/20260111509810.jpg
)
![[심호섭의전쟁이야기] 과감한 결단이 얻어낸 ‘전장의 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1/128/2026011150981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