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강화도로 이주해 ‘신강화학파’를 자처하며 시를 써온 하종오 시인. 그는 “내가 살아온 절차가 내가 죽음에 다가가는 절차”라고 썼다. |
두 눈을 뜨고 있으면
아들딸이 감겨주기를 원하고
숨소리를 내고 있으면
아내가 들어주기를 원한다
그때가 아침이라서 죽음이 햇빛으로 와
나의 빛나던 시절을 잠시 떠올리게 해준다면
나는 눈 감고 숨 멈출지도 모르겠다
“노환이 깊어서 병상에서/ 미동도 못하고 말 못하는 숙부가/ 나를 보고는 오른손 검지를 폈다// 두 살배기 외손이 배고프면/ 나에게 식탁 앞에 앉혀 달라고/ 오른손 검지를 펴서/ 의자를 향해 들던 모습이 떠올라/ 이제 숙부가 아기로 되돌아가서/ 손가락 하나로/ 의사 표시하는 법을 행하는가 여겼지만/ 속뜻을 알 수 없었다/ 병문안 와 주어서 고맙다는 손짓인지/ 병실 밖으로 나가자는 손짓인지/ 이승에서 마지막으로 악수하자는 손짓인지/ 내가 두 손으로 오른손 검지를 잡아주었을 때/ 숙부는 눈을 깜박였다/ 내 등 뒤에 와 있는 죽음을 가리켰는지…”(‘죽음에 다가가는 절차·1’)
강화도에 사는 하종오(64) 시인은 지난해 노환이 깊은 숙부가 병상에서 말은 못하고 오른손 검지를 펴는 모습을 보면서 죽음에 관한 연작시를 쓰기 시작했다. 두 살배기 외손이 배고프면 하던 손짓과 같은 늙은 숙부의 손짓을 보면서 죽어가는 세대와 새로 태어나 살아가는 세대 사이의 단절과 연속의 운명을 보았다. 이후 집중적으로 3개월 만에 써낸 시편이 55편에 이르렀고 최근 ‘죽음에 다가가는 절차’(도서출판b·사진)라는 이름으로 출간했다. 갓 태어난 아이와 죽음이 임박한 노인은 손짓 말고도 같아지는 지점이 많다. 이런 성찰은 어떠한가.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두 시절 아기를 업는다// 한 시절엔 자식을 아기 때 업고/ 한 시절엔 손자를 아기 때 업는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두 시절 자신이 업힌다// 한 시절엔 아기 때 부모님에게 업히고/ 한 시절엔 말년 때 자식에게 업힌다/ 두 시절 업는 일, 두 시절 업히는 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두 가지 다 했다면/ 충분히 산 사람이다”(‘죽음에 다가가는 절차·24’)
자식과 손자를 두 번 업고, 부모와 자식에게 두 번 업히는 삶이면 족하다. 그렇게 생을 누렸다면 죽음에 다가가서도 그리 서러워할 것 없다. 시인은 이미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주변에 부고하지 말고/ 장사 지낸 후에 알릴 것을/ 유언으로 써두었다”(‘죽음에 다가가는 절차·12’)고 했다. 그는 중년을 넘기면서부터 유언장을 쓰기 시작했는데 심경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고쳐 썼다. 고치다가 보면 유언의 문장이 어느 해엔 늘고 어느 해엔 줄어들기를 반복하다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어서 최근엔 아예 몇 줄만 남았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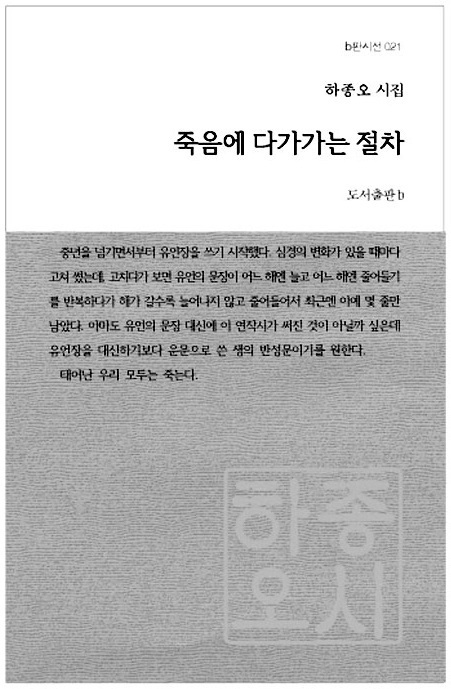
살아내기도 매일 벅찬데 미리 이렇게 죽음을 상기하는 건 생에 어떤 도움이 될까. 시인은 “살아 있는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면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걸 자각하게 된다”면서 “그 자각을 통해 죽음에 다가가는 절차를 살아낸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죽음은 나와 무관하다”고 쓴 이런 시와 그의 논리는 모순 아닌가.
“내가 살아있든 죽었든 간에/ 죽음은 나와 무관한다/ 살아있을 때는 죽음이 없고/ 죽었을 때는 내가 없기 때문이다/ 이 문장을 읽은 뒤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예순 줄에 든 나는/ 칠순이 넘도록 작품을 쓰고/ 팔순이 넘도록 작품을 쓴다면/ 아예 생사를 구분하지 않게 되리라고 상상했다”(‘죽음에 다가가는 절차·10’)
‘살아있을 때는 죽음이 없고 죽었을 때는 내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란 나에게 없는 것’이라는 고대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논리를 원용한 시편인데, 사실 죽음 그 자체를 살아 있는 생명체가 인식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 미리 죽음을 추체험하면서 고통스러울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가능해진다. 하종오 시인은 바로 이런 모순이 깃든 자리야말로 시가 탄생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런 모순이 존재하기에 역설적으로 시가, 문학이 필요하다는 맥락이다. 죽음에 다가가는 절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쓰고 난 시인에겐 한소식이라도 찾아들었을까. 그는 “죽음은 여전히 멀리 혹은 가까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 연작시가 유언장을 대신하기보다 운문으로 쓴 생의 반성문이기를 원한다”고 썼다.
“내 시집 한 권쯤, 내 시 한 편쯤은/ 마을도서관에서 읽을 수 있으리라는/ 헛된 기대를 하면서/ 나는 시를 쓰는 시간이면/ 시를 쓰다가 죽기를 원한다// 이렇게 내가 살아온 절차가/ 내가 죽음에 다가가는 절차다”(‘죽음에 다가가는 절차·42’)
조용호 문학전문기자 jho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총선 민심이 백지수표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4/25/128/20240425520860.jpg
)
![[현장에선] OTT들의 구독료 배짱 인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3/14/128/20240314519728.jpg
)
![[오늘의시선] 산으로 가는 연금개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1/05/128/20230105519484.jpg
)
![[세계와우리] 한국의 안보 포트폴리오와 ARF](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2/15/128/2024021551955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