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유럽 통합의 경험을 배우자며 한·중·일 3국 공동교과서 발간을 제안했으나 정부 차원의 논의는 답보 상태다. 반면 민간에서는 공동교과서를 향한 작지만 의미 있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한·중·일 3국 공동역사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 역사교재 발간이 그것이다. 3국 공동역사편찬위는 후소샤(扶桑社)교과서 파동을 겪은 세 나라 전문가들이 2002년 3월 중국 난징(南京)에서 열린 제1회 역사 인식과 동아시아 평화 포럼을 계기로 결성됐다. 2005년 3국의 첫 공동교과서 ‘미래를 여는 역사’라는 결실을 맺었고, 2012년에도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1, 2권을 3개 국어로 출간했다. 3국 공동역사편찬위의 한국 측 대표인 신주백 연세대 국학연구원 연구교수와 일본 측 대표인 다와라 요시후미(俵義文) 어린이와교과서전국네트21 사무국장에게 공동교과서 편찬 과정과 향후 전망을 물었다.
“무엇보다 어떤 사람들로 공동 교과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공동 교과서를 성공적으로 만들고 싶다면 각 정부의 입장이 아닌 연구자들의 조직인 역사학계가 추천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2005년과 2012년 한·중·일 3국 공동 역사교재 편찬 당시 일본 측 대표로 참여했던 다와라 요시후미(俵義文·73)는 3국 공동 교과서의 편찬을 위한 조언을 부탁하자 이렇게 대답했다. 역시 민간 학계가 주도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우익 교과서 채택 반대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네트21’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타와라 사무국장은 인터뷰 내내 자신이 참여해 만든 공동 교과서를 펼쳐 보이며 세세히 설명해주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 인터뷰는 지난 8일 도쿄 이다바시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일본은 엄격한 국가통제 시스템 하에서 교과서를 만들어 왔다. 한국도 일본보다는 약하지만 정부가 규제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시스템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공동으로 교과서를 만드는 것은 어려우며, 이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
―3국이 공동으로 역사교재를 2차례나 편찬했는데.
“2002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2005년 ‘미래를 여는 역사’를, 2012년에는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2권)를 차례로 펴냈다. 이전 한·일 양국 간 만들어진 교재도 있었지만 이는 토론하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마지막엔 각자의 주장을 담는 식으로 펴낸 것이다. 하지만 3국 공동교재는 토론을 해 일치한 내용을 서술하는 식으로 만들어 합의 지점이 높은 편이다. 원래부터 3개 국어로 편집 단계부터 펴낸 것도 특징이다.”
―2005년과 2012년 발간된 공동 역사교재 간 차이는.
“2005년판은 3국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중고교생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2권으로 구성된 2012년판은 상권이 근현대사 통사를 다뤘고 하권은 헌법과 도시화, 철도, 가족과 성 등 테마 중심으로 구성됐다. 대학생이나 일반인을 겨냥한 것도 특징이다.”
―3국 공동 편찬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2001년 일본에서 후소샤판 교과서가 채택돼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로부터도 비판이 제기됐다. 그해 10월 중국 사회과학원 내 일본연구소가 여는 국제심포지엄도 열렸다. 나와 역사학자 아라이 신이치(이바라키대 명예교수)가 함께 참가해 교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제안하게 됐다. 한국과 중국 학자들이 호응하면서 이듬해 3월 난징에서 열린 제1회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 포럼을 계기로 공동편찬이 시작됐다.”
―공동 편찬 기간 어려운 일도 많았을 텐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3국이 처한 조건이나 역사교육 상황이 다르다는 점이다. 최대한 토론을 하면서 3국 국가가 아닌 학자와 시민 등의 입장으로 3국이 동의할 수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도저히 공유할 수 없는 것도 있었다. 예를 들면 중국의 경우 톈안먼(天安門) 사건은 중국 정부와의 관계 때문에, 한국의 경우 당시 베트남전쟁은 터부(금기)여서 다룰 수 없었다. 일본의 경우 돈 문제가 힘들었다. 각자 돈을 갹출해야 했고 나중에 차입을 하기도 했다. 다행히 2005년판이 현재까지 9만부 정도가 팔려 인세로 당시 빌린 차입금을 갚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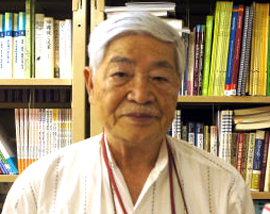
“역시 편집위원회 구성이 관건이다. 공동교과서를 만들고 싶다면 정부 입장이 아닌 학계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면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지금까지 공동연구로 도달한 것을 수용해 연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면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면서 진행이 되지 않는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체코 원전 수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1/128/20250501516408.jpg
)
![[기자가만난세상] 공교육 불신 부르는 한글 교육](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6/128/20250116519209.jpg
)
![[삶과문화] 나무에게 불러주는 자장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1/07/128/20241107520556.jpg
)
![[박일호의미술여행]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전의 미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1/128/2025050151618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