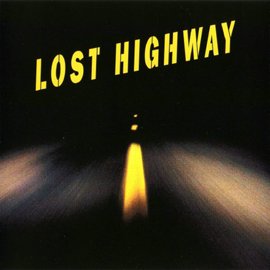 ‘트윈픽스’의 극장판 이후 5년 만에 돌아온 이단아 데이비드 린치는 여전히 충격적이었다. 혼란스러운 시간개념과 심인성 기억장애, 인격전이와 불길한 망상을 ‘엑스 파일’, 혹은 카프카적 방식으로 풀어낸 ‘로스트 하이웨이(Lost Highway)’는 다시금 우리를 미궁의 공포로 인도해냈다. 데이비드 린치 자신이 ‘작품 안에서 모든 설명이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듯 굳이 이해하려 할 필요없이 그저 스스로의 감각에 온전히 의지한 채 이 악몽을 지켜보기만 하면 됐다. 곧 열릴 ‘시네마테크의 친구들’ 영화제에서도 상영될 예정이다.
‘트윈픽스’의 극장판 이후 5년 만에 돌아온 이단아 데이비드 린치는 여전히 충격적이었다. 혼란스러운 시간개념과 심인성 기억장애, 인격전이와 불길한 망상을 ‘엑스 파일’, 혹은 카프카적 방식으로 풀어낸 ‘로스트 하이웨이(Lost Highway)’는 다시금 우리를 미궁의 공포로 인도해냈다. 데이비드 린치 자신이 ‘작품 안에서 모든 설명이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듯 굳이 이해하려 할 필요없이 그저 스스로의 감각에 온전히 의지한 채 이 악몽을 지켜보기만 하면 됐다. 곧 열릴 ‘시네마테크의 친구들’ 영화제에서도 상영될 예정이다.
색소폰 주자 프레드는 아내 르네와 평범한 생활을 영유하던 중 불길한 비디오 테이프와 메피스토 같은 사내의 경고를 받는다. 불현듯 르네의 살인범으로 지목되면서 전기의자 형을 선고받은 프레드는 느닷없이 피트라는 청년으로 ‘변이’되고, 조직의 보스 에디(혹은 딕)의 연인이자 르네와 똑 닮은 앨리스를 만나면서 혼돈에 빠진다. 앞뒤가 맞지 않는 전개에 주인공은 물론 보는 이들 또한 착란을 일으켰는데, 이 혼란에 얼마나 몸을 맞길 수 있는지가 바로 영화의 감상 포인트가 됐다. 1인 2역, 혹은 2인 1역으로 전개되는 극은 사실 그 어느 쪽도 현실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영화에서 음악은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었다. 데이비드 린치의 오랜 파트너 안젤로 바달라만티의 전형적인 암울한 신시사이저 트랙들, 재즈의 접근방식을 지닌 배리 애덤슨의 연주곡들, 그리고 앨범의 프로듀서인 나인 인치 네일즈 출신 트렌트 레즈너의 섬뜩한 기계음이 제각기 배치됐다. 각자 색깔은 달랐지만 모두가 어떤 종류의 광기를 끌어안고 있었다.
뫼비우스의 띠 같은 영화의 전개처럼 처음과 끝은 데이비드 보위의 ‘아임 디렌지드’가 혼돈의 고속도로를 질주할 무렵 쏟아진다. 다양한 음악들 또한 이어졌다. 피트가 마당에 누워있을 때 흐르는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인센사테즈’, 클럽에서 흐르는 스매싱 펌킨즈의 ‘아이’, 그리고 피트가 앨리스를 처음 본 순간 매혹적인 고속촬영화면 위에 깔리는 루 리드 버전의 ‘디스 매직 모먼트’ 등이 절묘하게 맞물렸다. 영화에도 출연하는 마릴린 맨슨 버전의 현기증 나는 ‘아이 풋 어 스펠 온 유’와 람스타인의 강력한 곡들, 그리고 디스 모탈 코일의 숭고한 커버곡 ‘송 투 더 사이렌’ 또한 불길하고 희미하게 뒤엉킨다.
영화 막바지, 트렌트 레즈너의 신경질적인 ‘드라이버 다운’이 흐를 무렵, 경찰로부터 달아나는 프레드의 부들부들 떠는 모습은 마치 전기의자에 의해 처형되는 장면처럼 겹쳐보이기도 했다. 감상하는 이들로 하여금 다양한 해석을 돌출해내는 데이비드 린치의 기술이 돋보였던 대목이다. 파탄 직전의 광기가 영상과 소리를 통해 촉감으로 전해져 온다. 이 기분 나쁨은 도무지 모방조차 불가능하다. 새벽의 고속도로에서 들으면 현실과 환상의 교차점이 충돌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희미하고 어슴푸레한 앨범은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 또한 충분히 즐길 만한 신비한 매력을 담고 있었다.
이 불길함으로부터 빠져나갈 출구는 없었다. 꿈을 꿀 때처럼 논리적으로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음에도 그것이 당연한 듯 진행되는 낯선 감각만이 유지된다. 그저 영화에서처럼 수수께끼의 비디오가 현관에 닿지 않길 빌 뿐이다. 오직 수수께끼만이 여전히 수수께끼인 채로 남겨진다.
불싸조 밴드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악의 축’ 부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4/28/128/20240428510563.jpg
)
![[특파원리포트] 숨겨진 총](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7/16/128/20230716516186.jpg
)
![[구정우칼럼] 양극화를 치유할 기회의 창](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2/26/128/20230226514242.jpg
)
![[심호섭의전쟁이야기] 무대 뒤편으로 은퇴한 ‘역전의 상륙작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2/18/128/2024021851038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