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 역량 제대로 발휘 못해… 연봉 낮춰 대학교수로 옮겨가기도
싱크탱크 사기높일 여건조성 시급
‘공무원보다 더한 철밥통.’ 국책연구소 연구원들은 한때 이렇게 불렸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쫓겨날 일이 없다’는 의미였다. 국책연구소 박사 연구원은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상황은 그러나 반대로 변했다. 그런 자리를 박차고 나가겠다고 아우성이다. 제발 좀 있어달라는 하소연에도 미련 없이 연구소를 떠나고 있다. 국책연구소의 공동화현상이 우려될 정도다. 이들이 변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국가두뇌 자부심을 키워달라
국가두뇌 자부심을 키워달라
27일 국책연구기관들에 따르면 박사 연구원들의 이탈에는 경직된 조직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전문가인 박사들은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성향이 강한 부류임에도 내부 문화는 이런 성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부 입맛대로 보고서를 써야 하는 상황이 많다 보니 학자적 자부심에 상처를 입는 일이 잦다는 지적도 있다. 한 국책연구소 소속 박사는 “각자 전문 역량을 극대화하기보다는 대부분 정부 부처가 원하는 보고서를 낸다”고 말했다.
그의 고백처럼 국책연구소 박사들이 정부 눈치를 보며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지난해 내놓은 ‘2009년 연구기관 평가’에 따르면 23개 국책연구소가 제출한 연구과제에 대한 정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엔 ‘매우 우수’(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평가를 받은 연구소가 단 한 곳도 없었다. 대신 ‘우수’(80∼90점) 평가를 받은 연구소가 12곳, ‘보통’(70∼80점)은 9곳이었다. 특히 ‘미흡’(60∼70점)하다는 평가를 받은 기관도 2곳 있었다.
하지만 올해 조사에선 딴판이었다. ‘매우 우수’ 평가가 1곳 나왔고 ‘미흡’으로 평가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나머지는 ‘우수’ 12곳, ‘보통’ 10곳으로 조사돼 23개 연구소 모두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국책연구소 박사들이 정부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내기 위해 스스로 정책 비판 기능을 자제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정부 정책에 반하는 보고서나 의견을 냈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과거 경험도 국책연구소 연구원들의 좌절감에 한몫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당했던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례는 국책연구원의 입에 ‘재갈’을 물린 대표적 케이스로 지금도 회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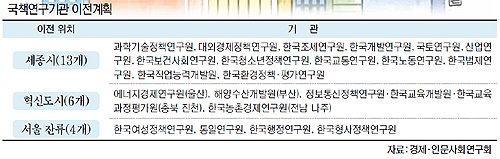
경제적 보상 문제도 한몫
 경제적 보상 문제도 이직의 동기가 되고 있다. 헤드헌팅업체 ‘커리어케어’에 따르면 과거 국책연구소 출신 박사들은 주로 대학교나 다른 연구소로 이직했으나 최근엔 대기업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구원 경력을 토대로 대기업으로 옮기면 대접이 임원급으로 ‘점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볼 때 이직의 동기 가운데 하나로 금전 문제를 꼽을 수 있다는 게 이 업체 설명이다. 최근 한 국책연구소에서 모 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A박사와 B박사는 연봉이 2배로 뛰어 곧장 ‘억대 샐리리맨’이 된 사례도 있다.
경제적 보상 문제도 이직의 동기가 되고 있다. 헤드헌팅업체 ‘커리어케어’에 따르면 과거 국책연구소 출신 박사들은 주로 대학교나 다른 연구소로 이직했으나 최근엔 대기업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구원 경력을 토대로 대기업으로 옮기면 대접이 임원급으로 ‘점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볼 때 이직의 동기 가운데 하나로 금전 문제를 꼽을 수 있다는 게 이 업체 설명이다. 최근 한 국책연구소에서 모 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A박사와 B박사는 연봉이 2배로 뛰어 곧장 ‘억대 샐리리맨’이 된 사례도 있다.
하지만 반드시 금전 문제 때문에 국책연구소 박사 연구원들이 이직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국책연구소 박사연구원의 직급은 ‘전문연구원→부연구위원→연구위원→선임연구위원’으로 나뉘는데, 전문연구원은 연봉이 6000만∼7000만원 수준이다. 국내 대표 민간연구소의 박사 초임 연봉 수준이 6500만원임을 감안할 때 연봉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한 국책연구소 인사 담당자는 “일부 박사 연구원은 자신의 연봉을 깎아가며 대학 교수로 가는 일도 있다”며 “이직의 동기가 금전적인 문제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사 연구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선 국가 경쟁력의 한 축인 국책연구소에서 일한다는 자부심만으로도 버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국책 연구소 한 관계자는 “물질적인 것보다 우리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부처 공무원들이나 국회에서 우리 연구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거시적 전략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때로는 엄격한 조건을 적용하기도 하는데 비판적인 의견은 전혀 수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국책연구소를 정책 싱크탱크로 활용하려면 정부와 연구소 사이에 건전한 긴장관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모·이희경 기자 jmki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서남아시아의 화약고’ 카슈미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8/128/20250508521259.jpg
)
![[기자가만난세상] 이례적 도시형 산불, 대책 마련 시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8/128/20250508521133.jpg
)
![[세계와우리] 트럼프 2.0과 한·러 관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8/128/20250508521239.jpg
)
![[삶과문화] 공연의 완성은 관객](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8/128/2025050852111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