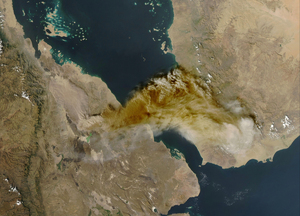고미술 ‘M1’·현대미술 ‘M2’·아동문화센터
서로 다른 건축가들이 3개의 건물 설계
최상부 요철형태 ‘M1’ 성곽도시 역사 연상
M2, 주변상황·용도 등 특이성 뽑아 건축
아동센터, 미술관 동선 등 주변 환경 수용
서울이 지닌 도시의 매력은 무엇일까?
이런 유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빠른 변화’를 서울의 매력으로 꼽았던 학부 시절 은사님이 떠오른다. 당시 나는 오랜 시간 축적된 역사와 도시 맥락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유럽의 도시를 동경했다. 그래서 교수님의 정의가 그렇게 와닿지 않았다. 이후 서울은 옛 모습을 완전히 지우지 않고 새로운 모습을 덧대왔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과정에서 다양함이 ‘병립(co-exist)’하는 모습이 서울의 매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당시 그 은사님이 언급한 ‘빠른 변화’는 ‘다양함이 병립’하는 결과를 만들어 낸 가장 강력한 동인이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소를 꼽자면 도심의 사대궁과 근현대 업무시설, 다양한 시대의 건축물이 둘러싼 서울광장 그리고 고전, 동시대, 도시의 맥락이 극적이고 세련되게 압축된 리움미술관이 있다.
1990년대 말, 삼성그룹은 두 개의 미술관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그중 하나가 리움미술관으로, 당시에는 ‘H프로젝트’로 불렸다. 총괄계획가를 맡았던 OMA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H프로젝트’는 다섯 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중 두 개는 미술관이었고 그 외에는 전시 공간, 강당, 체육관, 도서관, 뮤지엄 숍 그리고 특이하게 병원(Clinic)이 계획돼 있었다.
그런데 ‘H프로젝트’가 착공된 이듬해 IMF 외환위기가 터졌다. 결국 삼성그룹은 ‘H프로젝트’ 외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을 설계한 프랭크 게리(Frank Gehry)가 맡았던 또 다른 미술관 건립계획을 중단하게 된다. 사필귀정이라고 해야 할까? 이 미술관이 추진됐던 부지는 현재 ‘열린 송현동 녹지광장’ 자리인데, 2028년에 ‘이건희 컬렉션 미술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게리가 계획한 미술관이 무산되면서, 현대미술을 위한 전시 공간은 ‘H프로젝트’에 흡수됐다. 최종적으로 리움미술관은 고미술을 위한 M1, 현대미술을 위한 M2 그리고 아동교육문화센터, 세 건물로 정리됐다.
M1은 스위스 태생의 건축가 마리오 보타(Mario Botta)가 설계했다. 그는 기본적인 기하 형태를 바탕으로 좌우대칭과 같은 엄정한 질서를 지닌 건축물을 주로 설계한다. 건물의 외장재로 대부분 붉은색 벽돌이 사용되지만, 때로는 흑백의 강한 명암 차이를 주는 석재가 쓰이기도 한다. 그래서 보타가 설계한 건축물에서는 고전 건축의 미학이 강하게 묻어난다.
M1에서도 그는 직육면체와 뒤집힌 원뿔 형태를 활용하여 단순하고 근원적인 입체감을 구현했다. 특히 직육면체 최상부를 요철(凹凸)형태로 처리해 중세 성곽의 총안과 성곽도시였던 서울의 역사적 특징을 연상시키고자 했다. 뒤집힌 원뿔은 4개 층의 전시 공간을 연결하는 통로이자 미술관의 모든 동선이 시작되는 로비로 자연 빛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외부에서 보면 마치 개울에 꽂아놓은 빗살무늬 토기를 연상시키는데, 땅에 단단히 박혀 리움미술관 전체의 무게 중심을 잡고 있다.

M2는 프랑스 건축가 장 누벨(Jean Nouvel)이 설계했다. 누벨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차원의 ‘특이성’을 찾아내는 것을 설계의 기본으로 여긴다. 그는 각기 다른 장소, 건축주, 용도, 주변 상황에서 특이성을 추출한 뒤 건축물의 형태를 도출한다. 이 때문에 장 누벨에게 모든 건축물은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결과물이며, 건축물이 가치를 만드는 ‘다름’과 ‘차이’를 살릴 수 있을 때 삶이 풍요로워진다고 생각한다. 이는 인접한 M1을 설계한 보타가 문화적 원류성을 갖는 기하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두 건축가의 지향점이 극명하게 대비된다.
M2에서 누벨이 찾아낸 특이성은 건축물이 들어서기 위해 파낸 대지의 본래 형상이다. 그는 공사 당시 설치했던 흙막이벽을 그대로 보존하여 그 형상을 유지하고자 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불가능했고 결국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은 삼우설계가 제안한 공사 도중 나온 돌들을 철망태 안에 집어넣어 쌓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외장재 역시 처음 생각했던 붉은색의 코르텐 강(Corten Steel) 대신, 건물 전체가 하나의 판으로 읽힐 수 있도록 삼우설계와 전 세계를 뒤져 블랙 파티나(Black Patina)라는 재료를 찾아내 사용했다.
M2는 일반적인 미술관과 달리 모든 예술이 늘 새롭고 전위적이어야 한다는 현대예술의 테제를 건축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누벨은 임시적인 느낌을 주는 철망태 벽과 영속성을 강조하는 강철(블랙 파티나) 구조물을 건물 안에서 번갈아 보이도록 했다. 강철 구조물은 독립된 전시 공간이자 건물을 지지하는 구조체이다. 관람객은 개방된 전시실을 자신이 원하는 순서대로 오가며 작품과 바깥 풍경을 교차하며 감상할 수 있다.

아동교육문화센터는 네덜란드 기반의 세계적인 건축집단 OMA가 설계했다. OMA를 이끄는 렘 쿨하스(Rem Koohaas)는 서울을 “도시와 자연경관 사이 투쟁의 결과”로 정의하면서 경관과 건축의 “통합(Synthesis)”을 이루고자 했다. 아동교육문화센터는 입지적으로는 미술관과 주변 도시가 만나고, 동선적으로는 미술관으로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어야 하며, 기능적으로는 다양한 용도를 담아야 하는 가장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건축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쿨하스가 택한 전략은 건축가 고유의 디자인 특성과 의도를 최소화해 주변 환경을 최대한 수용하는 것이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외부에서 봤을 때 최소화된 것처럼 보이도록 했는데, 그 이유는 건축물이 품고 있는 검은색 콘크리트 박스 때문이다.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이 공간은 마치 블랙홀처럼 주변의 모든 시선과 동선을 끌어들이지만, 막상 안으로 들어서면 막혀 있지 않고 다른 공간으로 연결된다. 더불어 검은색 콘크리트 때문에 시각적으로 가장 무겁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건물 안에 떠 있는 역설적인 구조다. 보이는 것과 상반된 특성 때문에 초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블랙박스’는, 그러나 비행기나 차량의 주행 자료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장치처럼 이태원 언덕이라는 맥락을 고요하게 담고 있다.
2004년 10월13일에 열린 개관식에서 쿨하스는 “우리의 건축 언어는 완전히 다르다. 모두 똑같은 스타일의 건물을 만들었다면 셋이 함께 일하는 시너지 효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발언은 비단 리움미술관의 건축적 성취만을 설명하는 건 아니다. 리움미술관은 M1의 ‘고전’, M2의 ‘동시대성’, 아동교육문화센터의 ‘도시적 맥락’이 만나 ‘혼종적인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야말로 서울의 상당수 건축물이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다. 그래서 리움미술관은 고전, 동시대성, 도시적 맥락이 섞이고 병립된 서울의 매력을 건축적으로 압축하고 있다.
방승환 도시건축작가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공무원의 ‘복종 의무’ 삭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5/128/20251125518981.jpg
)
![[데스크의 눈] ‘AI 3강’, 백일몽 안 되려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5/128/20251125518976.jpg
)
![[오늘의 시선] 첨단산업 육성이지 금산분리 완화 아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5/128/20251125518424.jpg
)
![[안보윤의어느날] 너무 많은 사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5/128/2025112551840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