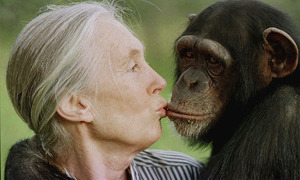미군의 서해 접근 차단 분석도
서해상 中관측부표 13개로 늘어
중국 해양경찰이나 공공기관 소속의 선박이 최근 수년간 제주 서남방 해상에 있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인근에서 포착됐다. 대만 문제를 놓고 미·중 무력충돌 우려가 커지면서 전략적 가치가 높아진 서해에 미군이 접근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9일 해군본부와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중국 해경선 또는 관공선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인근에 출현한 횟수는 11회다. 2021년에는 7회, 2022년과 지난해에는 각 2회씩 모습을 드러냈다.

중국 해경선, 관공선의 잇따른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인근 접근은 어족자원 확보, 배타적경제수역(EEZ) 확장 등 경제적 잇속을 염두에 둔 것은 물론 군사적인 고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중은 서해 등에서의 중첩 해역 EEZ와 대륙붕 경계를 획정하지 못한 채 2000년 어업협정을 근거로 양국 EEZ가 겹치는 곳에 잠정조치수역을 설정했다. 유사시 중국 북해·동해함대가 대만해협이나 태평양에 진출하려면 수심이 상대적으로 깊은 서해 잠정조치수역과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일대 해역을 지나야 한다. 중국으로선 대양 진출의 길목에 위치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서 자국 군함의 움직임이 노출될 가능성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서해에서 일방적·적극적 행보를 취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해양 권리 행사 범위를 확대, 서해를 내해(內海)로 만들어 자국 군대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미군의 중국 본토 연안 접근을 저지하는 ‘바다의 만리장성’을 서해에 구축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잠정조치수역 안팎에서 활동을 꾸준히 늘리는 모양새다. 2018년 2월 서해에서 처음 발견된 중국 해양관측부표는 7년 만에 13개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1개는 잠정조치수역 내에서 발견됐다. 중국은 잠정조치수역에 ‘양식시설’이라며 대형 이동식 구조물 2기(선란-1·2호)를 띄웠다. 철제다리를 바다에 박은 고정 구조물도 설치했다. 지난 2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조사선이 구조물 조사를 시도하자 중국 해경 등이 막았고, 한국 해경이 함정을 급파하면서 양측이 약 2시간 대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노벨상 강국 일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09/128/20251009511774.jpg
)
![[기자가만난세상] 숙의 민주주의도 곳간서 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4/128/20250814518001.jpg
)
![[삶과문화] 가득 찬 컵에서 흘러내린 물로 베풀어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09/128/20251009511351.jpg
)
![K드라마가 흔든 ‘엄마’ [이지영의K컬처여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09/128/202510095082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