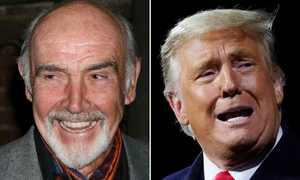조류를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복(鳥福)이 있다’고 하면 야생에서 보기 힘든 새를 자주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조복’ 중에서도 으뜸은 국내에서 아직 한 번도 기록된 적 없는 종을 자연 상태에서 최초로 발견하는 일일 것이다. 이는 조류 연구자뿐 아니라 탐조가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행운의 순간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9년 4월부터 서해 5도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겨울 철새의 주요 중간 기착지인 소청도에 국가철새연구센터를 설치하여 국내 도래 철새에 관한 연구를 지속해 오고 있다. 2019년 10월9일 센터에 근무하던 필자도 조복을 누린 적이 있는데 남쪽으로 이동하던 말똥가리 무리를 관찰하던 중 검은빛의 말똥가리류 개체를 처음 확인한 것이다.

말똥가리속(Buteo)에 속하는 종들은 일반적으로 외형상 ‘밝은 색 개체’와 ‘어두운 색 개체’로 나뉜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어 기록된 말똥가리류 중에는 큰말똥가리, 털발말똥가리, 대륙말똥가리 같은 3종의 ‘어두운 색 개체’가 관찰된 예외적 기록도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에 흔히 도래하는 ‘말똥가리’는 ‘밝은 색 개체’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당시 확인된 개체는 몸 윗면의 색과 형태가 기존 말똥가리와 유사했지만 날개가 더 넓고 꼬리가 더 둥글며 몸 아랫면은 날개깃과 꽁지깃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균일한 진한 갈색을 띠는 ‘어두운 색 개체’였다. 이 개체는 나중에 ‘히말라야말똥가리(Buteo refectus)’로 밝혀졌는데 히말라야말똥가리 밝은 색 개체는 우리나라에 흔히 도래하는 기존의 말똥가리와 외형적 모습이 유사하여 두 종 사이의 구분이 쉽지 않다. 그렇기에 그해 발견되었던 개체가 ‘어두운 색 개체’였던 것은 그야말로 행운 중의 행운이었다.
이처럼 예외적인 사례가 전 지구적 기후 변화 또는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유에 의한 것인지는 앞으로의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김동원 국립생물자원관 환경연구사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코리아 글로우 업](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31/128/20250731520509.jpg
)
![[기자가만난세상] 초고령사회 ‘국가 주도 돌봄’ 시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31/128/20250731520454.jpg
)
![[세계와우리] 안보의 본질은 자강(自强)](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31/128/20250731520499.jpg
)
![[기후의 미래] 플라스틱 협약과 만장일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31/128/2025073152046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