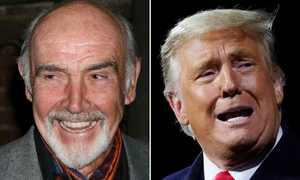사막의 작은 부족에서 G20 ‘우뚝’
‘미스터 에브리싱’ 빈 살만 왕세자
脫석유 관광·스마트도시 개혁 박차
민심·정치균형 외면 강압 그림자도
퇴보 vs 진화 갈림길… 지도력 중요
빈살만의 사우디 왕국/ 데이빗 런델/ 박준용 옮김/ 인문공간/ 3만5000원
‘빈살만의 사우디 왕국’은 21세기 유일 절대 왕정인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의 정치 메커니즘을 분석한 대중서다. 미국 외교관 출신 중동 전문가인 저자가 사우디 왕실의 놀라운 권력 유지 비결과 사막의 오아시스 작은 부족에서 주요 20개국(G20) 주요국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 등을 흥미진진하게 보여준다.

책에 따르면 사우디는 1953년 압둘아지즈 국왕 타계 이후 6차례 이상 평화적 권력 이양에 성공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이집트,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등 아랍 국가들이 쿠데타와 혁명으로 정권이 바뀐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현재까지 칼리드-파드-압둘라-살만 국왕으로 이어지는 형제 계승의 정권 교체는 혼란 없이 진행됐다. 지금은 ‘미스터 에브리싱’으로 불리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실질적인 통치자로 민주화 바람이 거센 21세기에도 굳건히 절대 왕정을 유지하고 있다.
사우디는 나날이 변화하고 있다. 오랜 시간 석유에 의존해왔던 나라가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광, 스마트 도시 건설에 눈을 돌리고 있다. 그 중심에는 빈 살만 왕세자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개혁 프로젝트 ‘비전 2030’이 있다. 이는 한마디로 사우디의 경제·사회 구조 전환을 위한 로드맵이다. 국가 재정의 70% 이상을 차지하던 석유 수익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 부문을 키워 일자리를 창출하며, 글로벌 투자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사우디 정부는 국부펀드(PIF)를 중심으로 전례 없는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대형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미래형 신도시 ‘네옴(NEOM)’이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의 44배에 달하는 면적에 5000억달러가 투입되는 이 도시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100% 재생에너지 기반의 도시로 설계됐다. 그 중심에는 길이 170㎞에 달하는 수평형 메가도시 ‘더 라인(The Line)’이 있다. 자동차도, 도로도, 탄소배출도 없는 미래 도시라는 콘셉트는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적어도 겉보기에 절대왕정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제 사우디 앞에는 전례 없는 도전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비전 2030’을 내세우며 탈석유 경제, 여성 권리 신장, 외국인 투자 유치 등 과감한 개혁을 감행하고 있으나 그 방식이 민심과 권력 균형을 무시한 채 강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저자는 우려한다. 여성 운전 허용, 극장 개방, 관광 비자 발급 확대 등의 진보적인 조치 뒤에는 언론 검열 강화, 반체제 인사 체포,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과 같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 있다.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 시대의 정치 참여 요구도 날로 커지고 있다. ‘빈 살만 시대 사우디 관찰자’라 자임하는 저자가 사우디의 안정과 번영이 앞으로도 계속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하는 이유다. 그는 원제 ‘Vision or Mirage’처럼 “비전인가, 신기루인가” 하는 의문을 던진다.
저자는 빈 살만이 추진한 ‘부패 척결’ 의도 역시 의심한다. 2017년 리츠칼턴 호텔에 사우디의 유력 기업가와 왕족들을 감금하고 수십억 달러의 합의금을 징수한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반부패 개혁이었으나, 저자는 “권력 집중을 위한 대규모 숙청”이라고 봤다. 빈 살만이 전통적인 권력 공유 시스템을 파괴하고, 모든 권한을 그에게로만 집중시키는 술책이었다는 것이다. ‘비전 2030’은 국제사회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대규모 실업 문제, 보조금 축소에 따른 불만, 과다한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 문제를 낳고 있어 성패를 예측할 수 없다고 한다.

저자는 사우디 정치의 핵심을 ‘균형’이라 진단한다. 알사우드 왕가(royal family), 수니파 개혁운동그룹 와하브(Wahhabism) 세력, 상공업계(merchants), 테크노크라트(technocrats), 부족(tribes) 지도자들이 서로의 권력을 견제하고 조율하는 구도가 20세기 중반부터 현재까지 왕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각 이해그룹 간 정교한 균형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의문이다. 저자는 “사우디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앞으로 10년간 더 억압적이고 불안정한 왕국이 될지, 아니면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왕국으로 진화할지는 전적으로 빈 살만 왕세자 지도력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한다.
책은 사우디를 ‘이상화하거나 악마화하지 않고’ 독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한다. 외부 관찰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각 부족의 관계, 종교 지도자의 역할 등에 대해 저자가 목격한 바에 따라 분석하면서 균형 잡힌 시각을 잃지 않고 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코리아 글로우 업](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31/128/20250731520509.jpg
)
![[기자가만난세상] 초고령사회 ‘국가 주도 돌봄’ 시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31/128/20250731520454.jpg
)
![[세계와우리] 안보의 본질은 자강(自强)](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31/128/20250731520499.jpg
)
![[기후의 미래] 플라스틱 협약과 만장일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31/128/2025073152046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