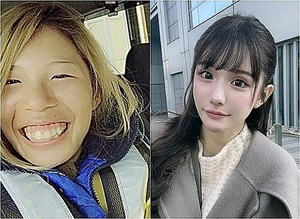어려서부터 노래를 좋아했던 소년은, 대학입시를 코앞에 둔 고3 수험생이던 1989년 10월 성악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교회와 학교 합창단 경험만 있던 소년은 벼락치기로 음대 입시를 준비했고, 운이 좋았는지 한번에 서울대 성악과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찍 성악을 시작한 동기들의 벽 앞에서 얼마 못가 한계를 느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괴로웠다. 실제로 대학 시절, 동기 중 70~80%가 콩쿠르 우승 이력을 갖고 있던 것과 달리 자신은 콩쿠르 실패의 역사만 썼다. 음악가의 길을 갈 수 있을지 스스로를 의심할 정도였다.

그랬던 그가 30년이 지나 독일어권 성악가의 최고 영예인 ‘궁정가수(Kammersänger·카머쟁어)’가 됐다. 지난해 5월 독일 쾰른 오페라극장에서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공연이 끝난 후 궁정가수 칭호를 받은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51·본명 윤태현) 이야기다. 궁정가수는 옛날 독일에서 왕이 뛰어난 성악가에게 내렸던 칭호다. 지금은 독일 주 정부에서 수여한다. 해당 성악가가 무대에 설 때마다 이름 앞에 궁정가수를 뜻하는 ‘KS’가 달린다. 전설적인 테너 프리츠 분덜리히와 루치아노 파바로티, 바리톤 디트리히 피셔디스카우 등이 이 호칭을 받았다. 한국인 궁정가수로는 사무엘 윤에 앞서 소프라노 헬렌 권과 베이스 전승현(2011년), 베이스 연광철(2018년)이 있다.
베이스부터 바리톤까지 소화하는 폭넓은 음역에다 덥수룩한 수염과 꽁지머리가 트레이드마크(상진)인 사무엘 윤이 국제무대 데뷔 25돌을 맞아 오는 29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한다. 공연 제목은 자신의 삶을 간추려 ‘어둠에서 빛으로(From Darkness to Light)’라고 지었다. 공연 1부에서는 슈베르트의 ‘도플갱어’, ‘죽음의 소녀’ 등 독일 가곡을 오케스트라로 편곡해 부른다. 2부는 유명 오페라에 등장하는 베이스 바리톤 아리아를 부른다.
그는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공연장 ‘포니정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저는 다른 이들보다 늦게 음악을 시작해 음악가로서의 가능성이 희박했던 오랜 기간을 참고 견뎠는데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든 자산이 됐다”며 “저의 지난 25년을 표현한다면 ‘다크니스(어둠)’라는 단어가 제일 어울린다고 생각해 이 제목을 붙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악가로 성공할 수 있을지 스스로 의심하던 시간부터 희망으로 고난을 견디기까지의 긴 시간이 함축된 말”이라고 덧붙였다.

사무엘 윤은 서울대 음대를 졸업한 후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음악원과 독일 쾰른음악원에서 공부했다. 오페라 가수 등용문으로 꼽히는 이탈리아 토티 달 몬테 콩쿠르에서 1998년 우승한 게 음악 인생의 큰 분기점이 됐다. 대학시절은 물론 성악의 본고장에 유학을 와서도 딱히 내세울 만한 것 없이 초조해하던 때 찾아온 선물 같은 우승이었다. 그 덕에 이탈리아 트레비소에서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로 데뷔할 수 있었다. 당시 악역 ‘메피스토펠레’를 맡아 수염과 꽁지머리 분장을 했는데 워낙 강렬한 인상을 남기면서 이후 그의 상징처럼 됐다. 아울러 콩쿠르에서 그를 눈여겨 본 독일 쾰른극장장의 제안에 따라 이듬해 쾰른극장 단원으로 본격적인 가수 활동에 나섰다.
한동안 단역을 맡으며 존재감이 크지 않았던 사무엘 윤이 국제무대에서 이름을 떨치기 시작한 계기는 2012년 독일 바이로이트 축제였다. 당시 개막작인 바그너 오페라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의 주역 예브게니 니키틴(바리톤·러시아)이 몸에 독일 나치를 상징하는 문신을 새긴 일로 논란이 돼 개막 나흘 전 물러났다. 전격 대타로 발탁된 사무엘 윤이 단 한 차례 무대 연습 후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치자 ‘바이로이트의 영웅’이란 찬사가 쏟아졌다. 그 공연을 봤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 부부까지 “독일어 발음이 너무 좋아 다 이해했다. 갑작스러운 주인공 교체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해냈다”라며 놀라워했다.
사무엘 윤은 이후 바이로이트 축제에 단골 가수로 초청되고, 런던 코벤트 가든, 베를린 도이치 오퍼, 드레스덴 젬퍼 오퍼, 밀라노 스칼라 극장, 파리 바스티유 극장, 마드리드 왕립극장, 바르셀로나 리세우 국립극장, 뮌헨 국립극장, 비엔나 오페라극장, 미국 리릭 오페라 시카고 등 세계 주요 극장에서 주역으로 맹활약했다. 쾰른극장에선 ‘종신가수’로 예우하는 등 65세까지 안정적인 자리를 보장했다. 하지만 그는 세계적인 성악가로서 화려하고 안정적인 삶을 포기한 채 지난해 한국으로 발길을 돌렸다. 서울대 음대 교수로 임용돼 후학 양성에 나서는 등 국내 성악계와 오페라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고자 내린 결정이다.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65세까지 쾰른극장에서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자리였고, 연간 10개월 이상 전 세계 극장들에서 공연하는 성악가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제가 주인공이 되고 돋보이는 삶보다 누군가에게 ‘쓰임’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무엘 윤은 “저는 과거에 빛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분명히 나를 보여줄 기회가 온다고 믿었다”며 “한국의 젊은 성악가들에게 인내와 기다림의 가치를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관중과 공유하지 않는 음악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공연장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분과 음악을 공유하면서 클래식 대중화의 길잡이 역할도 하고 싶다”고 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의협 회장 탄핵 위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0/31/128/20241031521267.jpg
)
![[기자가만난세상] 美 애틀랜타 교포가 기 펴는 이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0/31/128/20241031521213.jpg
)
![[세계와우리] 北의 우크라戰 참전, 방관할 수 없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0/31/128/20241031521263.jpg
)
![[조경란의얇은소설] 이게 다는 아닐 거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0/31/128/2024103152122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