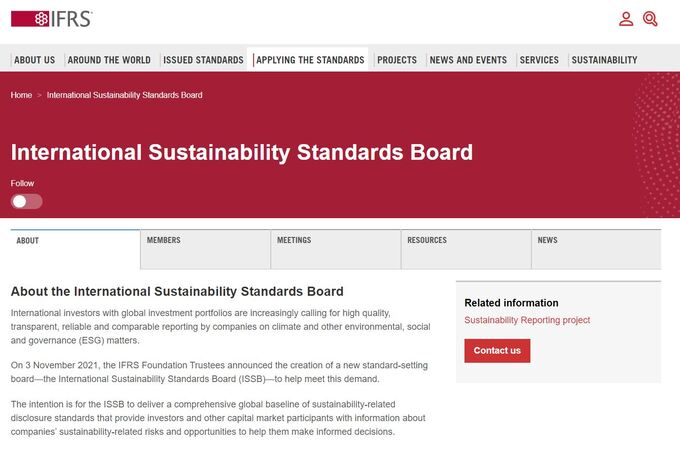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ESG 관련 공시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갈수록 세분화하고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비재무적 공시 관련 글로벌 표준을 준비 중인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지난달 31일 ESG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했다.
ISSB는 이번 초안 발표의 목적과 관련해 “정부, 정책 결정자, 민간부문(기업)이 자본시장을 위한 보다 높은 품질의, 비교 가능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요구안인 ‘S1’(General Requirements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과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안인 ‘S2’(Climate-related Disclosure)를 각각 발표했다.
오는 6월에 이 표준안이 최종 결정되면, 향후 전 세계 자본시장과 기업에 도입될 예정이다. 지배구조를 비롯한 기업의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및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 측정과 모니터링 등에 관한 관리 정보(사용된 지표와 목표 포함) 등이 투자자와 주주들에게 공개될 때 그 기준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ISSB는 향후 이 표준을 그동안 주요 기업 지속가능 보고서의 기준이 됐던 GRI(글로벌리포팅이니셔티브)와 통합 또는 호환시킬 예정이어서 ‘자본시장-투자자-환경-사회’로 이어지는 공시의 순환 배경을 모두 아우른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간 발표해온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범위가 크게 확장되고 강화되는 셈이다.
같은 시기 글로벌 투자자 연합 ‘기후행동100+(CA100+)’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166개 글로벌 기업의 기후 관련 지표를 분석한 ‘넷제로 컴퍼니 벤치마크’ 보고서를 발표했다. CA100+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후변화 투자자 그룹 중 큰손으로 꼽힌다. 700곳이 넘는 자산운용사가 약 68조 달러(8경2500조원)의 규모를 기후대응과 ‘녹색 금융’ 등에 투자하고 있다.
CA100+는 이 보고서를 통해 기업이 탄소 중립 목표를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주주도 적극적인 기후 공시를 기업에 요구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올해 연달아 발표한 실무 그룹 보고서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경제적, 사회적, 과학적으로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만큼, 기업도 이에 따라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 주주 역시 이를 기준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게 이 보고서의 골자다.
국내 기업 역시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일명 ‘탄소중립기후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탄소 저감 의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시기인데, 이처럼 글로벌 민간 투자자까지 이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월에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법(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의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에 따르면 기업의 제조 및 공급망에 연결된 모든 납품·협력기업에서 인권과 환경 관련 문제를 조사하고, 잘못을 고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공시까지 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U의 공급망 실사법으로 유로존 내 기업 1만2800개는 물론이고 권역 이외의 기업은 4000개 내외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EU와 무역해야 하는 국내 기업의 대책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국내 기업의 ESG 공시 의무 역시 구체적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지난해 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업 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가 올해부터는 자산 1조원 이상 상장법인으로 확대되고, 2024년 자산 500억원 이상 기업에 이어 2026년에는 코스피에 상장된 모든 기업이 대상이 된다. 기존 자율 공시 대상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역시 2025년에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으로, 2030년에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각각 의무 공시를 해야 한다.
ESG 관련 글로벌 주요 이슈인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과 ‘비재무적 공시’, ‘에너지 전환 및 녹색 금융’, ‘택소노미(분류체계)와 기업 투자’, ‘탄소 국경조정 및 탄소세’ 등 국내외 기업에 요구하는 ESG 의무와 가이드라인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ESG 관련 채권이나 펀드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그린 워싱’(green washing) 문제와 각종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지배구조 이슈까지 기업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요인이 태풍처럼 급격히 몰아친다.
우리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금융위, 기획재정부, 한국거래소 등이 저마다 ESG 규정과 택소노미, 평가 기준 등을 발표하는 등 기업의 ESG 활동을 관리 감독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크게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다. EU도 그렇고 미국 역시 ESG 정책 방향을 기업 규제로만 가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역내 기업의 보호와 촉진에도 만만치 않은 방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EU는 대표적으로 탄소 국경조정 메커니즘(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Emission Trading Scheme)를 통해 역외 국가에서 제품 제조 시 발생하는 탄소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한다. 나아가 EU에 수출하는 기업의 배출권 구매 의무화 등을 시행하여 유로존 내 기업을 보호하고 있다.
미국 역시 조 바이든 행정부는 ESG 정책의 핵심 기조로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기반을 둔 ‘바이 아메리카’를 공식 표명하고 있다.
당연히 한국 정부의 ESG 정책 역시 기업을 감시·관리하는 기능뿐 아니라 더 나은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더 친환경적인 산업으로 전환하는데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함께 방점이 찍혀야 한다.
이번 정부가 이러한 흐름에 다소 역행했다면, 새로 시작하는 정부에서는 분명 ESG 정책의 본질과 세계적인 흐름, 방향성 등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기구입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정미칼럼] 筆風解慍 <필풍해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9/128/20251229516821.jpg
)
![[설왕설래] 삼성의 독일 ZF ADAS 인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9/128/20251229516848.jpg
)
![[기자가만난세상] 낯선 피부색의 리더를 만난다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9/128/20251229516765.jpg
)
![[기고] 서울형 키즈카페가 찾아준 ‘놀 권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9/128/20251229516751.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