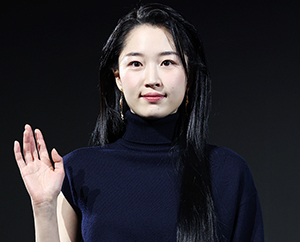北 핵무장 사실상 조력·방관자
사드 빌미 무자비한 보복 나서
‘안미경중’ 전략 탈피 결단 시점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입지는 흔들리고 있다. 안미경중(安美經中 :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입장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국익을 지켜보려던 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이제 우리는 분명하고 담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어떤 기준과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것인가. 불변의 최우선 국익은 국가안보다. 그렇다면 한국 안보에서 중국은 어떤 대상이며 어떤 존재인지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은 분단과 대결의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다. 분단 이후 북한군 형성과정에서 주력 부대는 중국에서 넘어갔다. 북한군의 골간을 제공한 셈이다. 어디 이뿐인가. 1950년 김일성의 6·25 불법 남침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고, 실제 그해 10월 하순 국군이 압록강까지 도달하여 통일을 목전에 두었을 때 중공군이 진입하여 이를 방해했다. 이후 중공군은 매 전투 시마다 유엔군보다 열세인 한국군을 주목표로 공격해 왔다. 6·25전쟁 중 중공군에 의한 가장 큰 희생은 바로 우리 국군이었다. 문제는 지난해 중국이 6·25를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이라며 승전 70주년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면서 반미의식 고취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말로는 남북의 평화통일 운운하면서 행동은 그 반대다.

둘째, 중국은 북한과 군사동맹이다. 6·25전쟁 당시 서로를 위해 피를 흘려 맺은 혈맹이다. 북한과 중국은 1961년 7월 11일 베이징에서 ‘조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을 체결했다. 동 조약 2조에는 “… 체결국 가운에 한쪽이 몇몇 동맹국의 침략을 받을 경우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며 의무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즉, 북한이 전쟁 상태에 돌입하면 중국은 지체없이 북한을 돕도록 되어 있다. 중국은 실제 그런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무력공격을 받고 있을 때 “상호 협의한다”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
셋째, 중국은 오늘날 북한 핵무장 과정에서 사실상 조력자, 방관자 역할을 해왔다. 이뿐 아니라 북한 비핵화 노력에 도움보다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할 때도 주로 북한을 두둔해 왔다. 물론, 2016년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동의하기는 했지만, 최근 북한 비핵화가 전혀 진전이 없고 오히려 김정은이 핵 무력 강화를 선포한 마당에도 안보리 제재를 완화하고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P5)으로서 결의이행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북한과 은밀하게 불법 거래한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중국이 북핵 해법으로 주장한 ‘쌍중단, 쌍궤병행’(한미연합연습과 북핵·미사일 실험 중단, 핵문제와 평화체제 문제 병행 협상) 주장도 실은 한·미동맹을 약화시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속내로 보인다. 2016년 북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주한미군 및 한국 안보를 위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도입했을 때 명백한 방어무기임에도 무자비하게 우리를 향해 보복을 가해온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인권 문제, 홍콩 문제 등을 제기하면 내정간섭을 하지 말라고 강변하고 있는 그들이 무슨 권리로 우리의 안보를 위한 주권적 결단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간섭한다는 말인가.
1992년 한국과 중국은 수교했고 이후 양국관계는 경제 분야를 비롯하여 눈부신 발전을 해왔다. 하지만 안보·군사 분야는 답보상태다. 중국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은 한두 번이 아니며 전혀 반성도 없다. 물론, 중국과 신뢰를 높이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하지만,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견제해야 할 것은 분명히 견제해야 한다. 더욱이 북핵·미사일 위협에 사실상 인질과 다름없는 한국 안보를 위해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할지 그 답은 명확하게 나와 있다. 지금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연명 의료 중단 인센티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7/128/20251217518575.jpg
)
![[세계타워] 같은 천막인데 결과는 달랐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7/128/20251217518533.jpg
)
![[세계포럼]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라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0/128/20250910520139.jpg
)
![[열린마당] 새해 K바이오 도약을 기대하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7/128/2025121751835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