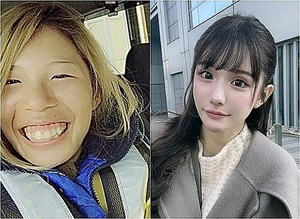지구는 매 순간 돌고 있지만 감지하기는 어렵다.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어야 실감할 따름이다. 우리 일상도 매번 똑같은 반복 같지만 기실 깨닫지 못하는 사이 미세한 균열이 일어나고 달라지는 게 사실이다. 그 균열을 감지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 소설가 백수린이 펴낸 짧은 소설 모음집 ‘오늘 밤은 사라지지 말아요’(마음산책)는 일상의 수면 아래 잠겨 있던 상실의 세목을 들추고 균열을 감지하며 회한과 위로에 대해 말하는 다감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다.
사귄 지 5년 된 기념으로 다시 도쿄로 여행을 떠난 ‘어떤 끝’의 여자는 그때와 달라진 것들을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여자는 남자가 부르는 소리에 말로는 응답을 하면서도 가지 않는다. “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해가 저무는 창밖을 바라본다. 다음이란 얼마나 쓸쓸한 말인가 생각하면서, 밤의 자락처럼 서서히 다가오지만 돌이킬 수 없음을 돌연 깨닫게 만드는 어떤 끝들에 대해 생각하면서.”
‘오직 눈 감을 때’에서 비혼의 프리랜서는 이십 대에 만났던 옛 애인을, 결혼해 아이까지 있는 그 남자를 예전에 자주 갔던 중국집에서 재회한다. 남자와 함께 옛일들을 활기차게 떠올리다가 여자는 그 추억들이 모두 상실의 목록이라는 사실에 절망한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내가 잃어버린 것,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오직 눈 감을 때에만 내게로 잠시 돌아왔다 다시 멀어지는 모든 것들이 한없이 그리워졌다. 내 것인 줄 알아차리기도 전에 상실해버린 그 모든 것들이.”

‘비포 선라이즈’와 ‘여행의 시작’에서는 각각 남편과 아내를 먼저 보낸 엄마와 아빠 이야기가 나란히 전개된다. 작심하고 효도하기 위해 엄마를 모시고 파리에 온 딸은 엄마의 무신경과 다른 취향 때문에 애가 타고 화가 난다. 엄마가 정작 청춘 시절에 보고 설렜던 ‘남과 여’의 무대 도빌 관광을 앞두고 흥분하는 모습에서, 엄마와 아빠가 만났던 애틋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딸은 엄마의 상실을 감싸는 온기가 가슴속에 차오르는 걸 느낀다. 아내를 먼저 보낸 아버지가 파리를 방문하는 이야기에서는 낯선 환경에서 ‘순식간에 늙어버린’, 상실의 끝에서 긴 여행을 시작하는 양상이다.
상실과 균열을 미세하게 감지해 내보이되, 위로와 희망을 외면하진 않는다. ‘언제나 해피엔딩’은 창문도 하나 없는 철학과 사무실에서 계약직 조교로 일하는 여자가 스쳐 지나는 말에서 위로를 얻는 이야기다. 언제나 피곤한 얼굴로 사는, 한마디로 훗날 그렇게 될까 두려운 사람의 전형인 박 선생이 무심코 던진 젊은 시절 영화관 아르바이트 경험담이 그것이다. 영화가 끝나면 손님들에게 출구를 안내해주기 위해 끝나기 직전 상영관 안에 먼저 들어가야 했기에 영화의 결말을 미리 다 알게 된 박 선생은 말한다.
“그 시절에는 뭐가 그렇게 인생에 불안한 게 많던지, 영화만이라도 결말을 미리 알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해피엔딩인 영화만 골라 볼 수 있잖아요.” “엔딩이 어떻든 누군가 함부로 버리고 간 팝콘을 치우고 나면 언제나 영화가 다시 시작한다는 것만 깨달으면 그다음엔 다 괜찮아져요.”
‘아무 일도 없는 밤’에는 심드렁하게 간병 대상 노인을 대하던 타국 출신 간병인 여자가 죽어가는 노인을 앞에 두고 마음을 열었던 눈 오는 밤 이야기다. 자녀들은 눈을 헤치고 오느라 늦어지고, 노인은 떠날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처럼 생사를 오간다. 노인을 탐탁지 않게 여겼고 죽음에는 무감해졌던 여자도 그날 밤만큼은 노인 곁에서 돈 벌러 갔다가 갑자기 죽은 남편과 자신의 쓸쓸한 처지에 대해 털어놓으며 말한다. 오늘 밤은 죽지 말라고, 오늘 밤은 사라지지 말라고.
일러스트레이터 주정아의 그림과 함께 이 책에 수록된 백수린의 길지 않은 이야기들이 따스한 실내악 소품처럼 다가오는 배경은 그녀가 상실로 인한 황폐함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일 터이다. 직장 생활에 지친 홀로 사는 여자에게 눈치만 보면서 맴돌던 유기견이 침대로 파고들어 전하는 ‘그 새벽의 온기’처럼, 그녀는 글을 통해 ‘물컹하고 따뜻한’ 실감을 지어낸다. 그 실감으로 13편의 실내악을 연주한 백수린은 “오늘 밤이 지나면 사라져버릴지라도 지금은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기미와 흔적을 언어로 붙잡아두고 싶었다”고 말한다.
조용호 문학전문기자 jho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의협 회장 탄핵 위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0/31/128/20241031521267.jpg
)
![[기자가만난세상] 美 애틀랜타 교포가 기 펴는 이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0/31/128/20241031521213.jpg
)
![[세계와우리] 北의 우크라戰 참전, 방관할 수 없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0/31/128/20241031521263.jpg
)
![[조경란의얇은소설] 이게 다는 아닐 거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0/31/128/2024103152122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