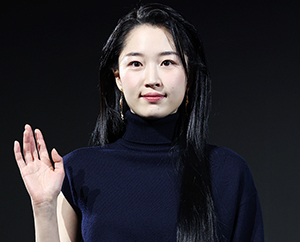성공한 사람들이 인터뷰할 때 종종 듣게 되는 얘기가 있다. 사업은, 일은 여기까지 왔는데, 자식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 많은 이들이 그 얘기에 공감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의 마음에 새겨진 상흔 혹은 상처이기 때문이다. 그 상처는 자식에 대해 기대를 빼고 힘을 뺄 수 있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어려운 자식 키우기를 잘 해내고 이제는 손주까지 잘 돌보는 어르신이 있다. 할머니의 품은 따뜻하고 넓어서 아이들은 할머니하고만 자려고 했단다. 큰아이는 종종 나는 엄마보다 할머니가 더 좋다며 할머니 품에 안겼다. 할머니가 어머니였던 것이다. 덕택에 할머니의 딸인 엄마는 경력 단절 없이 일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광주로 직장을 옮기게 되자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따라 이사했고, 더 이상 아이를 돌봐줄 수 없었다. 가끔 명절 때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보는 사이가 되고나서 5년, 가족의 달, 어버이날이라고 찾아온 두 아이의 대화는 할머니의 상처가 됐다.
작은아이가 나는 가족 중에 할머니가 가장 좋다고 하자, 이제 6학년이 된, 엄마보다 할머니가 더 좋다고 노래를 불렀던 큰아이가 동생을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다. 바보, 너는 가족과 친지도 구분 못하니?
그 얘기를 들은 우리는 까르륵, 웃었지만, 졸지에 가족에서 밀려나 ‘친지’가 된 어르신은 가슴이 저려왔다고 했다. 한참 웃고 나서 우리는 범인을 찾기 시작했다. 누가 할머니를 가족에서 밀어냈을까. 엄마를 사랑하는 딸이나 사위일 리는 없었다. 그때 교사를 하고 있는 여인이 말했다. 아,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가족의 범위에 대해. 핵가족제도 하에서 가족과 친지의 구분법에 대해.
진짜? 충격이었다. 차라리 가르치지를 말지. 교과서가 완벽한 진리인 줄 아는 시절, 그런 지식은 얼마나 오랫동안 삶의 발목을 잡을 것인가.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속에서 자란 나는 아직도 삼촌이 가족이고, 고모가 가족이다. 열 살 터울의 삼촌은 내가 5살이 되자 내게 바둑을 가르쳤다. 기타를 좋아했던 삼촌은 중학생이 된 내게 기타 치는 법을 가르쳐주다가 엄마에게 들켜 혼이 나기도 했다. 공부해야 하는 애 데리고 놀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면 그 시절, 그들이 없었다면 나는 얼마나 각박한 사람이 돼 있을 것인가. 자기 용돈 아껴가며 밥 사주고, 빵 사주는 삼촌이 있었다는 것이, 결혼을 하고 나서도 언제든 우리가 찾아가면 반색하고 반겨주며 한 상을 차려주는 고모, 이모가 있었다는 것이 나는 어린 시절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보니 내게 가족은 거기서 확대된 밥상 공동체다. 나는 생각한다. 가족은 기분 좋게 밥상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어르신과 함께 밥을 먹었던 그 자리의 막내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인이었다. 그 여인이 어버이날 아이에게 받은 카드를 보여준다. 해석이 필요한 카드의 내용은 이것이었다. 엄마, 매일매일 밥 해줘서 고마워요.
그 여인이 말한다. 임신중독증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했던 6년 전에 소고기 버섯국을 끓여주고, 고추장 더덕을 가져와서 함께 밥상을 나눴던 이웃 여인 때문에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있게 됐다고. 그때 밥이 하늘이라는 것을 경험한 후에 가족이란 다름 아닌 밥상을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다.
밥이 하늘이다. 김지하 시인이 강조한 것이기도 하지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 일은 하늘을 몸속에 모시는 일이고, 하늘을 혼자서 못 가지는 것처럼 밥도 나눠 먹을 때 힘이 더 생긴다. 가까운 가족이란 것도 따져보면 함께 밥 먹고 놀면서 시간을 쌓아온 사람 아닌가. 함께 따뜻한 밥상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서로서로 좋아하는 것을 챙겨주며 서로를 온기로 간직하는 사람, 그들이 가족 아닐까. 그 온기는 사람을 고립시키지 않는 에너지다. 그 온기야말로 세상 부러울 게 없는 느낌으로 세상사를 소화해 내는 에너지일 것이다.
이주향 수원대 교수·철학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징벌적 판다 외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6/128/20251216517712.jpg
)
![[데스크의 눈]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에 부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6/128/20251216517704.jpg
)
![[오늘의 시선] ‘똑부형’ 지도자가 경계해야 할 것](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6/128/20251216517681.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나의 다크호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6/128/20251216517691.jpg
)





![[포토] 한소희-전종서 '여신들의 미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7/300/2025121750069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