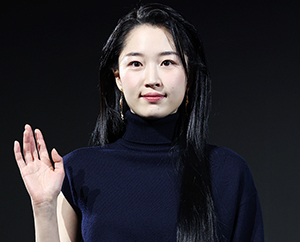지난달, 몽골 출신 결혼이주여성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활발히 활동 중인 분에게서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다문화가족 자녀 상당수가 이미 사회에 진출했고 다수가 사회 진출을 준비 중인데, 정작 이들에겐 역할 모델도 없거니와 선택지도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안타깝다는 이야기였다. 1990년대 초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의 일환으로 결혼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니, 초기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은 이미 20대 중후반에 접어들었을 것이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어린 시절 사회화 과정을 연구한 보고서를 보면, 친구와 피부색이 달라서, 외모가 눈에 띌 만큼 남달라서, 한국어 발음이 서툴거나 어눌해서 늘 주변 사람으로부터 차별과 놀림의 대상이 되거나 교실에서 왕따를 당한다는 내용이 단골로 등장한다. 이런 일상적 차별과 이유 없는 혐오에 어느덧 익숙해지고 군살까지 배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정작 사회에 진출할 때가 되고 보니, 다문화 2세대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데 대한 반성과 회한이 밀려온다는 것이, 이즈음 이주 엄마의 솔직한 심정이라는 것이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 땅을 밟은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말”만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면 어렵지 않게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으리라는 환상에 빠졌다. 그리하여 자식만큼은 자신처럼 한국어가 서툴러 서러움을 경험하지 않도록, 한국말을 가르치는 데 그 누구보다 열과 성을 다했다. 행여 엄마 나라의 말을 배우고 싶어할까봐 두려워했다는 이주여성도 있었다 한다.
그러는 사이 엄마 나라의 언어는 서서히 잊혀 갔고, 엄마 나라를 향한 관심이나 호기심도 희박해져 갔다. 엄마 나라의 언어를 잃어버린 다문화가족 2세대 자녀들은,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둘러싸고 깊은 고민과 끝없는 방황 속에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다문화가족의 엄마들이 현실이 녹록지 않음을 깨닫게 된 계기 중 하나는 최근 증가하는 동남아시아 출신 유학생의 존재였다. 실제로 베트남계 한국인 자녀들은 베트남 유학생과의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다는 우울한 소식이 들려오기도 한다. ‘엄마가 집에서 베트남어를 사용하는 것을 꺼려서’ ‘엄마에게 베트남어를 배우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결국 베트남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결과, 좋은 일자리는 베트남 유학생 몫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1960,7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따라 미국에 이민 갔던 한국인 얼굴이 오버랩된다. 영어에 한(恨) 맺혔던 부모 세대는 자녀가 ‘영어를 빠다(버터) 바른 듯’ 유창하게 할 수 있도록 영어교육에 올인했다. 영어만 잘하면 명실공히 미국 시민으로서 기회의 균등과 공정함을 이상으로 하는 미국 사회에서 부모들이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룰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자녀를 위해 이민을 선택했던 부모들이 몰랐던 사실이 있다. 미국 시민권을 인정받는다 해서 미국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부모가 한국인일 경우 자녀들에게는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고, 이들은 한국인도 아니요 미국인도 아닌 제3의 더블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나아가 미국에서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어와 한국어 모두를 모국어 수준으로 구사해야만 한다는 것을 부모들은 미처 알지 못했다.
실상 엄마 나라의 언어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의미를 넘어, 엄마 나라의 역사와 전통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잃지 않음을 의미한다. 베트남계 한국인이라면 베트남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모국어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을 때, 양국 간의 관계를 이어주거나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좋은 일자리의 기회 또한 넓어질 것이 확실하다.
이제야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를 위해 엄마 나라의 언어를 가르치지 못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한다. 물론 한국에서 베트남어,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를 배울 만한 변변한 곳이 있느냐는 따가운 지적은 새겨볼 만하다. 그럼에도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필히 이중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만 글로벌 기업이나 국제기구, 해외 미디어 등의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다.
지나간 경험은 더 이상의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타산지석이 되어줄 때, 그 의미가 배가(倍加)될 것이다. 50여년 전 미국에 이민 갔던 한국인들이 겪었던 꿈과 좌절 사이의 고통을, 오늘 이 땅의 다문화가족 부모와 자녀가 똑같이 겪고 있음은 진정 가슴 아픈 일이다.
이쯤 되면 다문화가족을 위해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다가오는 듯하다. 최근 직장 내 다문화 차별 사례의 하나로, 버젓이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다문화”라 부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다면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가족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는 우리 모두가 수강자가 돼야 할 것 같다. 나아가 다문화가족을 위해서는 자녀교육 시 이중 언어 구사의 필요성과 더블 정체성 구축의 중요성을 교육해야 할 것 같다. 이를 위한 지원은 가능하다면 어린 시절부터 집중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시작은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함인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치매 머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5/128/20251215517423.JPG
)
![[주춘렬 칼럼] ‘AI 3대·반도체 2대 강국’의 현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0/128/20251020518406.jpg
)
![‘주사 이모’가 사람 잡아요 [서아람의 변호사 외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3/128/20251103514866.jpg
)
![[박소란의시읽는마음] 어제와 비에 대한 인터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5/128/202512155174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