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부순(74·여)씨는 2011년 아들 정훈씨를 잃었다. 집에서 갑작스레 쓰러진 아들은 결국 깨어나지 못했다. 뇌사 판정이 내려지자 장씨는 아들의 장기기증을 결심했다. 안구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난 김수환 추기경이 떠올라서였다. 하지만 이유 모를 죄책감은 아직도 장씨를 괴롭게 만들고 있다. “어떻게 엄마가 돼서 죽은 아들의 몸에 칼을 대게 했느냐”는 누군가의 말은 비수로 박혔다. 그럴 때면 눈을 감고 ‘잘한 결정이다’란 말을 수백번 되뇌곤 했다. 장기기증자 유가족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씨는 “심적으로 힘들어도 아무도 손잡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며 “지금도 아들의 흔적이 이 세상에 남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다”고 토로했다.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기증자 유가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라 장기를 이식받은 이와의 서신 교류나 기증인을 기억할 수 있는 추모공원이라도 있었으면 한다는 게 유가족들의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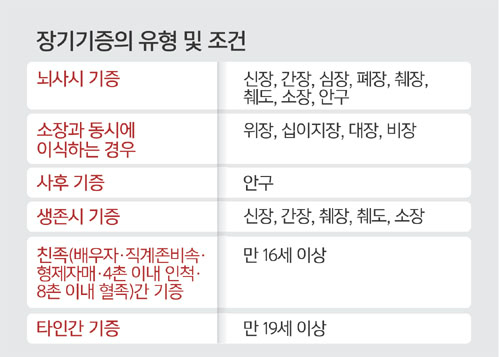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의 장기 기증을 결정한 김모(69·여)씨는 “주변에서 ‘아이를 두 번 죽인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괴로웠다”며 “대부분 유족들이 비슷한 경험을 토로하곤 하는데, 좋은 일을 하고 나서 왜 이런 시선을 감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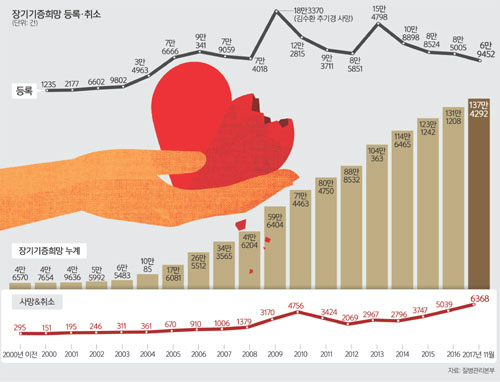
미국에서는 이식인과 유가족 간의 교류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4184㎞를 달려 숨진 딸의 심장을 이식받은 흑인 남성의 심장 소리를 들은 50대 남성의 사연이 크게 보도되기도 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관계자는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배려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추모공원이나 서신교류, 유가족 심리치료 등이 전제된다면 장기기증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트럼프의 거짓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5/08/128/20240508519604.jpg
)
![[세계포럼] 민주당의 착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1/01/128/20231101522921.jpg
)
![[세계타워] 전공의 사태 매듭 풀릴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1/01/128/20231101522811.jpg
)
![[사이언스프리즘] 온라인 인간관계와 정신건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2/28/128/20240228519685.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