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미망인이 남편을 따라 세상을 떠나는 인도의 의식 ‘사티’. 플랑드르 화가 발타자르 솔빈스가 1796년 인도 콜카타에서 제작한 판화다. 글항아리 제공 |
그러나 뒤르켐의 이론을 반박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탈리아의 사회학자 마르치오 바르발리는 ‘이기적 자살’보다 ‘이타적 자살’이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20세기의 마지막 40년 동안 자살 테러범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이타적 자살이 등장했고, 서유럽의 자살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바르발리는 신간 ‘자살의 사회학’에서 뒤르켐의 이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자살론을 제시한다.
바르발리는 자살의 원인이 사회가 아닌 개인의 의도에 있다고 본다. 그는 자살의 유형을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공격적 자살’ ‘무기로서의 자살’로 분류한다. 이기적 자살과 이타적 자살은 뒤르켐의 이론에서 빌려온 것이지만, 그 원인이 사회가 아닌 ‘개인’의 의도에 있다고 본다. 이기적 자살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나 질병, 파산 등 여러 이유로 고통을 끝내기 위해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목숨을 끊는 것이다. 반면 이타적 자살은 누군가를 위해 삶을 포기하는 것이다. 인도에서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그 길을 따르는 의식인 ‘시티’와 중국 여성들이 정절을 지키려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공격적 자살과 무기로서의 자살은 자살을 보복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개인적인 이유로 타인을 해치고자 하는 자살이 공격적 자살이라면, 일본의 자살특공대 가미카제나 자살 테러범의 죽음은 무기로서의 자살로 분류된다.
바르발리의 자살 유형에는 뒤르켐이 주장한 사회적 요인이 작용하지만 책은 정신의학적, 심리적, 문화적 요인까지 살핀다. 특히 종교는 큰 영향을 준다. 초기 기독교 순교자들은 신앙을 버리기보다 죽음을 택했다. 이후에는 기독교가 자살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면서 유럽에서의 자살률이 줄어들었다. 중국 불교의 교리 문답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비난하면서도 ‘군주에 대한 충·효·정절·정의·전쟁’에 의한 선택은 정당화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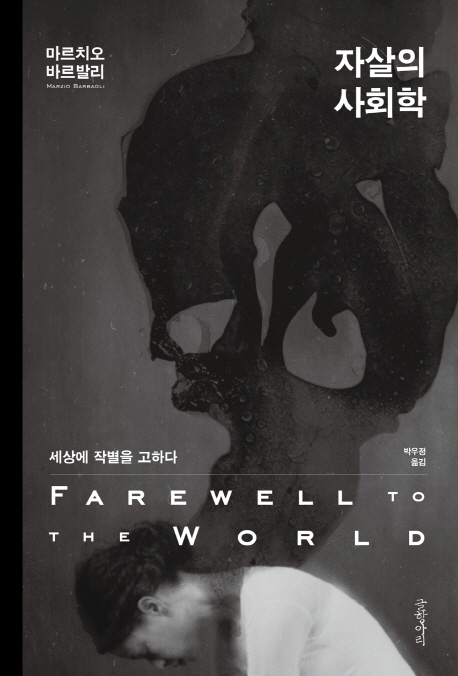
정치적 요인도 있다. 아시아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집단이나 사람들이 자살을 일종의 무기로 활용했다. 분신자살은 정치적·종교적 적수에 대항하는 집단적 항의수단으로 지금도 이용되고 있고, 헤즈볼라에서 시작된 자살공격도 여기에 해당한다.
저자는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이타적 자살의 중요성이 높아진 현상도, 서유럽에서 이기적 자살과 아노미적 자살이 빠른 속도로 줄어든 현상도 사회적 통합과 규제의 변화로 설명되지 않는다”면서 “사회적 통합과 규제라는 두 원인만 검토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오직 두 원인만을 바탕으로 분류한 자살의 유형을 계속 이용해서도 안 된다”고 피력한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기로에 선 이란 신정체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2/128/20260112516715.jpg
)
![[김기동칼럼] 경제엔 진영논리가 없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2/128/20260112516766.jpg
)
![[기자가만난세상] 할인받았다는 착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2/128/20260112516675.jpg
)
![[조홍식의세계속으로] 위선조차 내던진 트럼프의 제국주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2/128/2026011251665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