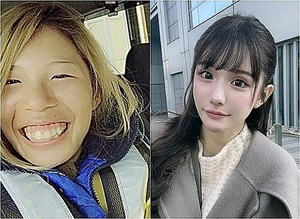고통만 연장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술 좋아하는 70대에 “오래 살려면 금주”
‘의학적 조언이 과연 옳은가’ 의문 던져

이만하면 괜찮은 죽음/데이비드 재럿/김율희/윌북/1만58000원
“노쇠한 바다인 나 데이비드 제릿은 멀쩡한 정신으로, 내가 정신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병약해질 경우에 대비해 내가 바라는 내용을 분명 밝힌다. 만약 나에게 치매가 생긴다면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 심부전이나 당뇨 등 노인의 흔한 질병 위한 어떤 예방 약물도 원치 않는다. 암 치료는 생명 연장보다는 고통 경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끝이 눈에 보이면 나는 모르핀을 넉넉히 투여받고 싶다….”
노인의학전문의로 40여년간 노년기를 보내는 사람들을 주로 돌봐온 저자 데이비드 제럿이 이 책에서 공개한 생전 유언장의 일부다. ‘이만하면 괜찮은 죽음’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품위 있고 우아하게 생을 마감하는 ‘죽음 수업’에 관한 책이다.
그는 죽음 수업의 하나로 죽음에 대비해 자신처럼 생전 유언장이나 생전 진술서를 쓸 것을 권고한다. 자신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가족과 의료진이 어떤 결정을 해주면 좋겠는지 정리하라는 것이다.

그가 이 책에서 제시한 ‘33가지 죽음 수업’은 죽음을 미화하거나 억지 교훈이나 감동을 끌어내지 않는다. 의료 현장을 스케치하듯 담담하게 보여주며 죽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촉구한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논의를 정부가, 사회가, 개인이 이제 더 자주 이야기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저자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많은 노인 환자들이 중환자실로 들어가는데 중환자실 환자의 5분의 1만이 살아서 나온다. 유럽의 경우도 입원 환자 중 5분의 1이 사망하고 퇴원한 이들 가운데 1년 안에 또 5분의 1이 숨을 거둔다. 실제 많은 중환자실 전문의들이 입원한 환자와 그 가족에게 진전 없는 치료행위의 무익한 이유를 설명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낸다. 생존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을 위해 최첨단 기술을 갖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현대 의학은 생의 시간을 늦추었지만, 그로 인해 기나긴 죽음, 즉 너무나도 서서히 죽어가는 노인이 많아졌다. 그런 만큼 이제는 나이 든 환자이기 이전에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온 한 인간의 마지막 순간이니,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책에서 시종 주장한다.
그가 제시하는 사례는 흥미로우면서도 죽음에 관한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한다. 여기, 사냥을 좋아는 한 노인이 있다. 불편한 몸이지만 오늘도 새벽부터 사냥을 떠난다. 숲 속에서 홀로 죽었다고 해도 그 죽음이 과연 잘못되었다 말할 수 있는지 저자는 반문한다. 와인을 가장 좋아하는 70대에게, “와인을 끊으세요. 그래야 오래 삽니다”라는 의학적 조언이 과연 옳은가 하는 의문을 던진다.
저자는 또 ‘아드백 해법’을 언급한다. 자신을 삶을 끝내는 방법을 독자에게 설명한다. “아내와 나는 질병이 주는 부담이 커지면 어느 추운 밤에 아주 훌륭한 싱글몰트 위스키 한 병을 들고 함께 숲 속으로 들어가자는 이야기를 즐겁게 나눈다. 며칠 뒤 빈 병 옆에서 얼어붙은 우리의 시신이 발견될 것이고 그 병에 든 위스키가 혈관을 확장한 탓에 우리는 인사불성에다 저체온증 상태에 빠진다.” 삶을 떠나기 위한 탑승 대기를 위해 선택한 것이 위스키라는 것이다. 이 역시 고통스럽고 추한 죽음보다 자기결정권을 갖게 됐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수도 없이 심정지 호출, 일명 ‘블루라이트 경보’에 시달리며 죽음이란 도처에 있다는 것을 일상에서 경험했다는 저자는 영화나 드라마와 달리 대부분의 소생 시도가 실패로 끝난다는 외면하고픈 사실도 설명한다. 죽음은 영화나 소설에서 그리는 것 이상으로 실제는 비극적이고 불행하고 비참하다는 것이다.
인간의 삶을 대초원을 배회하는 버팔로 떼와 비교한 내용이 인상적이다. “이 버팔로 떼 옆, 시야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하나님과 알라와 크리슈나와 우리가 창조한 모든 신들이 있다. 이런 신들과 철학자들은 활과 화살로 무장하고서는 거만한 태도로 잘난 체하는 무리를 향해 화살을 마구 쏘아대는 중이다. 그러니 ‘왜 하필 나야?’라고 묻지 말라. ‘왜 내가 아니지?’라고 물으라. 아직 화살에 맞지 않았다면. 당신이 따르는 신이나 철학자가 누구이건 그 존재에 감사하고 할 수 있는 한 가장 멋진 삶을 계속 꾸려 나가라.” 책이 주는 묵직한 메시지다.
저자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되며, 죽음을 생각하는 하루가 삶을 생각하는 하루보다 나을 수도 있다고 강조한다. 인류의 기대수명이 길어진 만큼 ‘노년기의 죽음’은 이전과 다른 프레임으로 새롭게 논의돼야 한다는 그의 일관된 주장이다. 책은 두렵기만 했던 우리의 죽음에 대해 보다 냉철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박태해 선임기자 pth1228@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의협 회장 탄핵 위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0/31/128/20241031521267.jpg
)
![[기자가만난세상] 美 애틀랜타 교포가 기 펴는 이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0/31/128/20241031521213.jpg
)
![[세계와우리] 北의 우크라戰 참전, 방관할 수 없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0/31/128/20241031521263.jpg
)
![[조경란의얇은소설] 이게 다는 아닐 거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0/31/128/2024103152122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