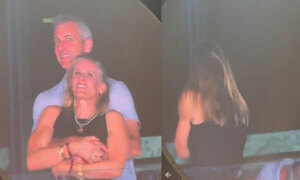‘광명성 3호’의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긴장감이 급격하게 고조되고 있다. 그것이 인공위성인지 장거리미사일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둘 사이에 기술적 차이가 크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광명성 3호’의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긴장감이 급격하게 고조되고 있다. 그것이 인공위성인지 장거리미사일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둘 사이에 기술적 차이가 크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국가적 성취의 ‘상징’으로 작용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례로 1957년 10월 4일 소련이 최초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 발사를 성공시켰을 때, 소위 ‘스푸트니크 충격’을 받은 미국은 항공우주국(NASA) 설립과 아폴로계획 등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우주개발을 시작했다.
하지만 북한의 장거리 로켓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상징적 측면 외에도 과학기술정책의 시각에서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 특히 최근 화두로 부상하는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을 통해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해 시의적절한 대처 방법을 얻을 수 있다.
‘적정기술’은 1970년대 에너지 위기와 맞물려 부상한 개념으로, 최근 국내외적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적정기술은 궁극적으로 해당 사회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적정기술은 그들의 상황에 적합하고도 비용 효율적인 기술을 의미하고, 선진산업 국가에게는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기술을 함축한다. 즉, 해당국가의 산업발전 상태와 상관없이 적정기술의 핵심은 ‘인간존엄성’과 ‘지속가능성’인 것이다. 이러한 적정기술은 ‘삶의 질 향상’, ‘시민 참여’ 및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정책 기조와도 맥을 같이한다.
그렇다면 북한이 개발 중인 장거리 로켓 기술은 과연 북한에게 적정한 기술인가. 적정기술의 개념으로 돌아가 판단해 본다면 그 답변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 사회에서 장거리 로켓 기술은 전혀 효율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언론보도에서 인용된 바와 같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개발비용은 8억5000만 달러에 이른다.
지난해 목성에 로봇탐사선 주노(Juno)를 발사하는 등 우주개발의 선봉에 섰던 미국이 최근 ‘달착륙’ 계획에 대해 포기선언을 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재정적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주 선진국인 미국에서조차 우주개발계획이 재검토되고 있는데 하물며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추진은 재정적 측면에서 무리수임이 명약관화하다.
북한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수용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그들 사회에 적합한 과학기술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이다. 요컨대 북한의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은 그들 사회의 적정기술을 모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김병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가상 아이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21/128/20250721517200.jpg
)
![[주춘렬 칼럼] 쌀·소고기 개방의 늪](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21/128/20250721517184.jpg
)
![[기자가만난세상] ‘오겜3’ 222번 아기와 소아 수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21/128/20250721517151.jpg
)
![[조홍식의세계속으로] 美·中 고래싸움과 유럽 새우들의 잰걸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21/128/2025072151709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