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수요에 따라 자율통합 이뤄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우리금융의 매각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은금융이 우리금융을 인수하는 것이 유력한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산은금융과 우리금융을 합치면 자산이 500조원을 넘는 세계 54위의 대형은행으로 태어난다. 합병의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산은금융은 기업금융에 강하다. 우리금융은 소매금융에 강하다. 따라서 기업금융과 소매금융을 결합한 다양한 형태의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그렇다면 합병된 새 금융그룹이 국제적인 메가뱅크로서 성공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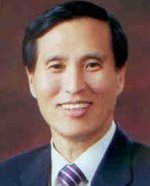 |
| 이필상 고려대교수(전총장)·경영학 |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이 국내시장 독점이다. 두 금융그룹을 합치면 기업금융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는다. 따라서 경쟁력을 높이는 대신 독점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자금차입 의존도가 높아 은행이 시장지배력을 가지면 쉽게 초과이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메가뱅크가 반대로 국제경쟁력을 해치는 모순이 발생한다.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큰 것이 관치금융의 부활이다. 두 그룹을 합치면 국내 최대의 정부 소유 금융그룹이 탄생한다. 따라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낙하산 인사를 하고 금융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산은금융지주 회장들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인사들이다. 이런 상태에서 산은과 우리금융이 정부 소유의 메가뱅크로 태어나 관치금융을 주도할 경우 금융산업의 발전은 불투명해지고 경제는 금융위기를 다시 겪을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갖는다.
공적자금 회수가 지연되는 것도 문제이다. 정부는 공적자금이 국민의 돈인 만큼 가급적 조기에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산은금융이 우리금융을 인수하면 재정자금으로 공적자금을 상환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더욱이 합병 후에 지분을 매각한다면 규모가 커 매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얼마의 시일이 걸릴지 모른다. 우리금융은 국민의 피와 땀이 어려 있는 곳이다. 외환위기가 터지자 수많은 근로자가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 나왔다. 그래도 은행은 살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은행을 모아 살려 놓은 것이 우리금융이다. 이런 우리금융을 다시 정부 소유로 만들어 공적자금 상환을 미루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계속 강요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이 다양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될 경우 두 금융그룹의 합병은 경제를 다시 인질로 잡는 공룡뱅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금융을 어떻게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우선 정부는 민영화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금융을 지속적인 통제 대상으로 간주하고 민영화에 소극적이었다. 또 부실매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높은 가격을 받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계속 미루었다. 그러나 민영화를 통해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국민경제적 효과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우리금융을 독자적으로 민영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단 정부지분을 대량매각 방식으로 일반에게 공개 매각해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해야 한다. 이 경우 계열사의 일괄 매각에 집착할 필요도 없다. 시장 상황에 따라 계열사를 분할 매각하는 것이 공적자금 회수와 금융산업 발전에 더 유리할 수 있다. 다음 대주주그룹이 시장의 엄격한 감시하에 자율적인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투명한 전문경영 체제를 구축하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정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통제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이어 금융회사의 인수와 합병을 자유화해 시장 수요에 따라 자율통합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이것이 시장경제의 순리이다.
이필상 고려대교수(전총장)·경영학
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손절론 제기된 김어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9/128/20260209518485.jpg
)
![[기자가만난세상] 샌프란시스코의 두 얼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7/128/20251117516885.jpg
)
![[김기동칼럼] 대통령의 집값 ‘승부수’ 통할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9/128/20260209518460.jpg
)
![[박현모의 한국인 탈무드] ‘실크로드 제왕’ 고선지는 왜 버려졌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9/128/2026020951838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