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몸에서 피멍을 처음 본 것은 늦은 오월의 일이었다. 관리실 옆 화단의 모란은 잘린 혀 같은 꽃 이파리들을 뚝뚝 뱉어대고, 노인정 어귀의 보도블록에는 문드러진 흰 라일락꽃들이 행인들의 구두 밑창에 엉기던 봄날이었다.”(「내 여자의 열매」, 216쪽)

아내의 피멍 이야기로 시작하는 단편소설 「내 여자의 열매」를, 한강은 『창작과비평』 1997년 봄호에 발표했다. 바닷가 빈촌에서 성장한 아내는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시에서 성장한 남편은 그런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두 사람은 점점 소통하지 못한다. 자유를 꿈꾸던 아내는 마침내 침묵하고, 그러던 중 연두색 피멍이 생겨난다. 베란다에서 햇볕을 쬐는 것만 좋아하던 아내는 급기야 점점 나무로 변해 가는데…. 소통 불능과 이해 불능으로 나무가 되는 존재! 그럼에도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나무가 되어가는 아내를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화분에 심고 돌본다.
“아내는 베란다의 쇠창살을 향해서 무릎을 끓은 채 두 팔을 만세 부르듯 치켜 올리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진초록색이었다. 푸르스름하던 얼굴은 상록활엽수의 잎처럼 반들반들했다. 시래기 같던 머리카락에는 싱그러운 들풀 줄기의 윤기가 흘렀다…. 그것을 아내의 가슴에 끼얹는 순간, 그녀의 몸이 거대한 식물의 잎사귀처럼 파들거리며 살아났다. 다시 한 번 물을 받아와 아내의 머리에 끼얹었다. 춤추듯이 아내의 머리카락이 솟구쳐 올라왔다. 아내의 번득이는 초록빛 몸이 내 물세례 속에서 청신하게 피어나는 것을 보며 나는 체머리를 떨었다. 내 아내가 저만큼 아름다웠던 적은 없었다.”(「내 여자의 열매」, 233-234쪽)
#『채식주의자』의 원형, 「내 여자의 열매」
한강은 단편 「내 여자의 열매」를 기점으로 여성과 몸으로 주제의식을 확장하는 한편, 강렬한 환상성도 드러내기 시작한다. 이와 함께 과거의 상처보다는 현재 서로간의 몰이해와 소통 불능으로 고통을 겪는 인물들이 전면으로 부상한다.
“…몰이해와 소통 불능이 인물들을 괴롭게 한다. 현재 발 딛고 있는 시점에서 고통의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 고통은 사랑하는 이와의 소통 불능이다. 그리고 소설이 바로 이 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김선희, 2013.8, 2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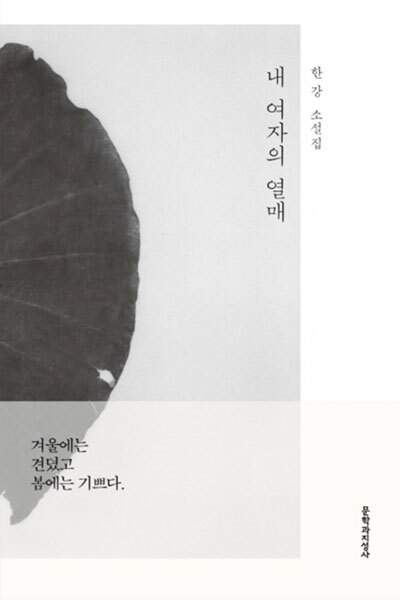
특히 「내 여자의 열매」는 나중에 한강을 인터내셔널 부커상을 안긴 『채식주의자』의 씨앗, 원형이 된다. 그는 「내 여자의 열매」를 썼을 때 언젠가 이 작품을 변주한 소설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채식주의자』의 「작가의 말」에서 밝혔다.
“10년 전의 이른 봄, 「내 여자의 열매」라는 단편소설을 썼다…. 언젠가 그 변주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했다. 10년 전의 내가 짐작했던 것과는 퍽 다른 모습이 되었지만, 이 소설이 출발한 것은 그곳에서였다.”(『채식주의자』, 272쪽)
#여성과 몸, 환상성으로 확장
한강은 2000년 「내 여자의 열매」를 비롯해 그 동안 발표한 단편들을 묶어서 두 번째 소설집 『내 여자의 열매』(창비)를 출간했다. 『여수의 사랑』 이후 5년 만이었다. 소설집에는 표제작을 비롯해 「해질녘에 개들은 어떤 기분일까」, 「아기 부처」, 「어느 날 그는」, 「붉은 꽃 속에서」, 「아홉 개의 이야기」, 「흰 꽃」, 「철길을 흐르는 강」 8편의 단편이 담겨 있다. 소설들은 대체로 사랑과 소통에 실패한 여성과 인물들이 등장해서 갈망하던 세상과 소통하려다가 어긋나고 상처 입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소설집 『내 여자의 열매』의 「작가의 말」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나는 때로 다쳤다. 집착했고 욕망했고 스스로를 미워하기 시작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배웠고, 점점 낮아졌고 작아졌고, 그래서 그 가난한 마음으로 삶을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되었던 것 같다. 깊숙이 들여다보려 애썼던 것 같다. 그러는 동안 글쓰기는 나에게 존재하는 방식이었다. 숨 쉴 통로였다.”
아무튼, 자연스럽게 이 시기부터 그는 짓눌린 여성의 목소리를 표현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여성주의 작가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동세대 작가들과 다른 작품 세계를 형성했던 한강은 언제, 어떤 계기로, 그리고 왜 가난과 고단함을 배경으로 고전적 서사와 진중한 문장의 작품 세계에서 여성성과 몸, 환상성을 특징하는 작품 세계로 바뀌어 갔던 것일까. 기자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분명한 대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단편소설은 좀 더 개인적인 것입니다. 삶이 저라는 인간을 흔들거나 베고 지나가거나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자리의 감각과 생각과 감정을 씁니다. 인간에 대한 질문들을 끈질기게, 전심전력으로 들여다봐야 하는 게 장편소설이라면, 단편은 개별 장들처럼 전체 구도 속에서 계획된 어떤 게 아니고, 저라는 인간이 여기까지 (때로는 기어서, 때로는 꿋꿋하게 걸어서, 때로는 어둠 속을 겨우 더듬어서) 살아온 기록입니다.”(김은경, 2018.11.30.)
한강은 2018년 소설집 『여수의 사랑』, 『내 여자의 열매』, 『노랑무늬 영원』 세 권을 재출간하면서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단편소설은 좀 더 개인적이고, 지나가고 있는 자리의 감각과 생각, 감정”이라고 말했다. 그의 소설의 변화와 확장 저류에는 어떤 삶이나 감정이나 의식의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혹시 결혼이나 임신 및 출산과 관련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막연히 추측만 해볼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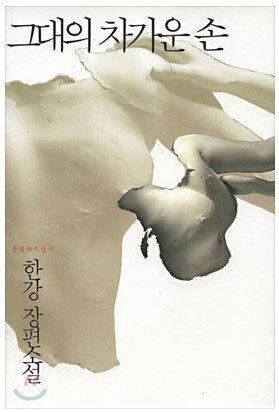
#『그대의 차가운 손』…“곡예사 같은 가면의 인간 묘파”
2002년, 그는 두 번째 장편소설 『그대의 차가운 손』(문학과지성사)을 발표했다. 실종된 조각가가 여성의 신체 석고 모형 제작에 집착하며 남긴 원고를 재현한 작품이다. 액자 소설 형식으로, 조각가 운형과 그가 만나는 여성 L과 E라는 여자의 이야기가 액자의 안쪽을 이룬다.
“내가 남과 다르게 보고 생각한다는 것은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남들이 모두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을 집요하게 의심했고, 남들이 모두 만족하는 것들에 만족하지 못했으며, 남들이 전혀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보이고 들리고 냄새를 풍기고 만져지는 모든 것들의 안쪽을 꿰뚫어 보기 위해 나는 안간힘을 썼다.”(『그대의 차가운 손』, 83쪽)
운형은 가면 뒤에 숨은 진실을 확인하려는 욕구로 사람들의 신체 부위에 집요하게 눈길을 보내는 사람이다. 진실을 향한 운형의 욕구는 병적일 정도로 완강하다. 그러다가 운형은 유년 시절에 성폭행을 당한 트라우마로 폭식증과 비만증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 L의 희고 섬세한 손과, 어린 시절 육손이였던 과거에 시달리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E의 차갑고 예쁘지 않는 손을 보게 된다. 운형은 마침내 삶의 껍데기 위에서 곡예 하듯 탈을 쓰고 살아가는 인간 존재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데.
소설에는 여러 손들이 나온다. 오발탄에 오른쪽 엄지와 검지손가락의 윗마디들을 잃어 불구가 된 외삼촌의 손부터, L의 성스러운 손, E의 차갑고 예쁘지 않는 손까지…. 과연 당신의 손은 어디에….
장경렬 서울대 교수는 액자 소설의 형식을 취해야 할 필연성이 잡히지 않거나 인간과 세상에 대한 작가의 이해가 작품 바깥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지적하면서도, 이야기를 엮어가는 작가의 능력이나 유려한 문장이 돋보이고, 특히 무엇보다 성실하고 진지하다고 칭찬했다.
“이야기를 엮어가는 작가의 능력뿐만 아니라, 유려하고 명징한 문장 구사 능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또한 요즈음 발표된 작품들 가운데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성실하고 진지한 작품이기도 하다.”(장경렬, 2002 여름, 25쪽)
특히 작품은 석고로 인체의 본을 떠내는 라이프캐스팅 작업을 통해서 인간의 가면성, 위선의 인간 본성을 파헤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데르스 올손 노벨문학상위원회 위원장은 작품이 “가면 쓴 곡예사처럼” 살아가는 인간의 속성을 묘파했다고 평했다.
“인체 해부학에 대한 집착과 페르소나와 경험 사이의 유희, 조각가의 작업에서 신체를 드러내는 것과 감추는 것 사이의 갈등이 발생합니다. ‘삶은 심연 위에 아치형 시트를 얹은 것이고, 우리는 가면 쓴 곡예사처럼 그 위에서 살아간다’는 책의 마지막 문장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줍니다.”(노벨상 위원회 홈페이지)(→제6화에 계속)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비화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3/128/20241213500261.jpg
)
![[기자가만난세상] “국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2/128/20241212519979.jpg
)
![[세계와우리] 미국과 민주주의 동맹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3/128/20241213500164.jpg
)
![[김미월의쉼표] 이것이 정말 소설이라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3/128/20241213500101.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