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리의 연금술사 영화에 숨결을 불어넣다 스크린 뒤에서 걸어나온 폴리아티스트 문재홍씨 입력 2012-11-01 17:48:52, 수정 2012-11-01 18:12:56  ‘광해’에서 ‘큰일 보는 소리’를 만든 과정을 알면 그의 일이 쉽게 이해된다. “케찹보다 점성이 좀더 좋은 마요네즈에 약간의 휴지를 넣은 다음 쥐어짰어요. 구멍을 막고 있다가 한꺼번에 나오게 해야 해요. ‘푸드득 퍽 뿌직’ 하는 소리가 다양하게 나죠. 흐물하게 떨어지거나 바닥에 닿는 소리는 또 따로 녹음하고요. 매화틀에 앉아 있어서 소리가 막힌 듯한 느낌도 따로 작업해요.”  소리로 관객과 만나온 문재홍 실장이 2일 오후 6시 스크린 뒤에서 걸어나온다. 문 실장은 제10회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마스터 클래스에서 폴리 아티스트의 작업을 소개한다. 소리에 신경을 썼을 때 영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고괴담’을 실례로 보여준다. 편집된 영상에 청중이 직접 소리를 만들어넣는 기회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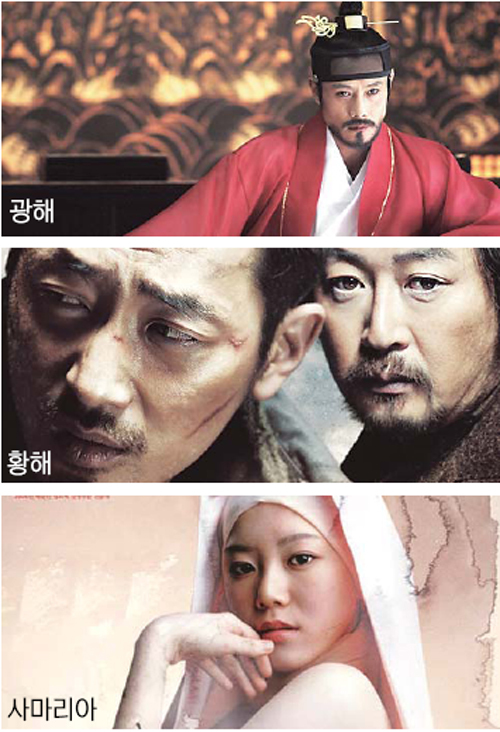 폴리 아티스트는 대사·음악·일반적인 효과음·배경음을 제외한 소리들을 직접 만든다. 일종의 소리 연금술사다. 자동차 출발음이 배경에 깔리면 폴리 아티스트는 흙이 튀거나 헛바퀴가 도는 특수한 상황을 소리로 표현한다. 이들은 소리를 통해 스크린에 감정을 입힌다. “숲에서 주인공이 떨고 있다면 옷이 ‘사사사삭’ 하는 소리를 넣어요. 일상에서 이 떨림은 주인공만 느낄 수 있는데, ‘사사사삭’ 덕분에 관객도 같이 떠는 듯 몰입하게 되죠. 담뱃재가 쭉 타들어가는 소리를 넣으면 관객이 흡연자와 가까이 있는 듯 확 빠져들어요. 우리는 인물이 걸어갈 때 단순히 ‘발소리가 없어서 비어보이니 집어넣어’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 저 배우가 왜 저기로 걷는지, 기쁜지 슬픈지를 소리로 표현하려 노력해요.”
“‘저런 쇳덩이에선 이 소리가 나는구나, 둥글게 쌓인 낙엽을 차면 이렇구나’ 하고 머릿속에 도서관처럼 소리들이 쌓여요. 당장은 의미 없지만, 나중에 작업하면서 특정 소리가 필요할 때 이 소리들이 기억나요.”  “저처럼 프리랜서이거나 폴리실을 갖고 작업하면 미수금이 생겨요. (폴리 아티스트가 계약하는) 녹음실들이 되게 작아서 선후배 관계가 많아요. 인맥으로 얽혀 있어 보수를 달라는 말을 잘 못해요. 미수금이 안 쌓이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사운드 쪽 일은 대부분 밤을 새우고 돈도 많이 못 받고 계속 배워야 하니 떠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이 일을 한다는 건 그냥 좋아서, 먹고살 정도만 되면 계속하겠다는 분들이죠.” 올여름 사운드 엔지니어들과 녹음실 대표들이 모여 한국음향인협회를 만들었다. 이들은 작업 단가가 현재 마이너스 수준이라는 데 공감하고 계약금 현실화를 고민할 방침이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