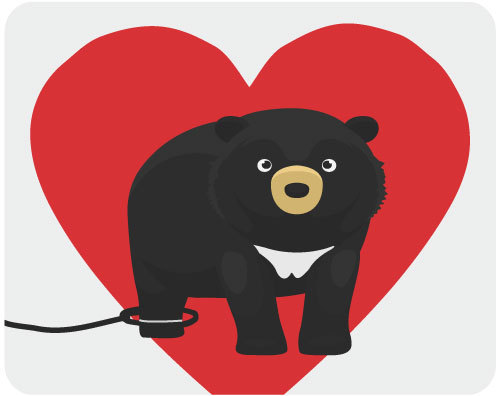
‘애완동물’ 대신 짝 ‘반’(伴)자와 짝 ‘려’(侶)자를 쓰는 ‘반려동물’이라는 말에 기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사람 인(人)자가 붙은 ‘반려’는 사람의 짝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동물을 사람의 짝으로 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인데, 개와 고양이들 처지에서도 ‘반려’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 동물의 삶의 질은 본디 사람과 멀수록 높다. 사람의 손때 자체가 동물들에게는 스트레스다. 말이 좋아 ‘반려’이지 실상은 사람들 욕심을 채우기 위해 동물을 길들이는 것이다. 반려동물에게 있는 문제의 원인은 그렇게 키운 사람에게 있다. 반려견을 ‘개과천선’시키려면 주인이 먼저 개과천선해야 한다.
인간의 위협에서 벗어나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 같은 야생의 세계에서 자유롭게 사는 동물은 극소수다. 대부분은 인간의 눈치를 살피며 살거나 인간의 손길에서 벗어나려 애쓴다. 동물과 함께 살기 위해 동물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대부분은 동물을 먹잇감이나 돈벌이 수단으로 여길 뿐 그들의 생명과 안전엔 관심이 없다.
세렝게티 동물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무관심이지만 우리 주변의 동물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관심이다. 새끼 개구리 수만마리가 콘크리트 방호벽에 막혀 떼죽음을 당하고, 한 해 30만마리의 야생동물이 도로에서 허망한 죽음을 맞고, 반달가슴곰이 올무에 걸려 비참한 최후를 맞는 불행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보다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이 되려면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김기홍 논설위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우주항공청과 존 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4/24/128/20240424518768.jpg
)
![[세계포럼] ‘절대의석’이 부른 삼권분립 위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6/07/128/20230607522919.jpg
)
![[세계타워] 허먼 멜빌의 ‘모비딕’ 완독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1/31/128/20240131519365.jpg
)
![[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언제까지 미생일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4/24/128/2024042451874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