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달한 시풍으로 생명,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왜곡되지 않은 본연의 모습을 시로 써온 문정희(71) 시인이 열네 번째 시집 ‘작가의 사랑’(민음사)을 펴냈다. 시집 출간을 계기로 전화로 만난 그녀는 어느 젠더로 태어날지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운명에 차별과 폭력의 굴레를 씌우는 세상을 높은 목소리로 성토했다. 그녀가 이런 목소리를 시에 담아온 건 본인의 말처럼 오래된 일이다. 이번 시집에서는 탄실 김명순(1896~1951)을 위한 진혼가 ‘곡시(哭詩)’에 그 오래된 마음을 다시 쏟아 넣었다.
 |
| 열네 번째 시집을 펴낸 문정희 시인. 그는 “살다 보니 맨땅에서 언어를 찾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웃음과 눈물 사이를 더듬거리는 늙은 코미디언 같더라”면서 “그래도 살아 있으니 아름답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이화전문을 나온 여성으로 한국전쟁 직전 해방공간에서 간첩이라는 죄목으로 총살형을 당한 김수임(1911~1950)을 두고는 “서구 언론이 동양의 마타하리라 하지만/ 그녀는 하늘 아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여/ 완성을 이룬 여자/ 그것 말고 더 큰 명예가 없다는 듯이/ 기꺼이 사라진/ 애인이라는 이름의 여자”라고 썼다. 이처럼 선명한 어조로 여성 현실을 토로하는 한편에는 여전히 시인 특유의 솔직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시편들이 가득하다.
“비행기가 곧 이륙할 시간/ 따스한 이 살로 언제 다시 만날까요/ 시간은 맹독을 품어/ 검은 흙이 우리의 침대가 되겠지요// 내 몸은 이미 당신의 뼈와 살로 된 신전/ 지상에 살아 있는 한/ 이 신전에는 더 이상/ 어떤 신도 들어설 곳이 없을 거예요.”(‘공항의 요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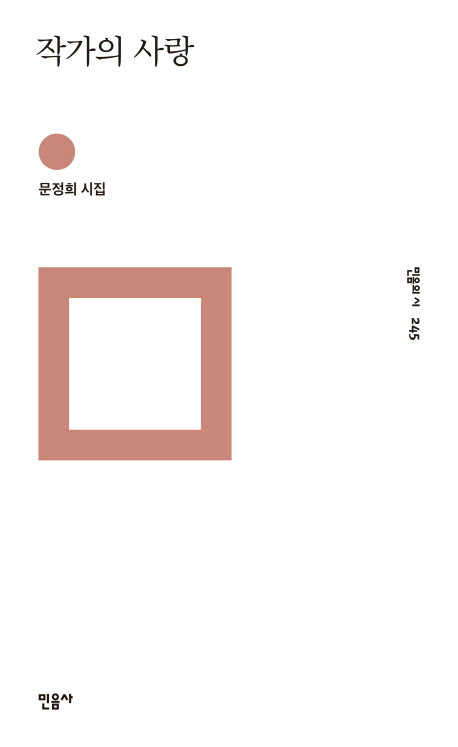
문정희는 “살아보니 웃음과 눈물 사이를 더듬거리고 있는 모습이더라”면서 “맨땅에서 언어를 찾아보려고 버둥거렸는데 고독이니 슬픔이니 언어들이 다 실존을 표현하기에는 미흡했고 공간을 넓히기 위해 징검다리를 건너듯 세계를 떠돌아보았어도 다 꽝이요 폐허였다”고 말했다. 시인은 “웃음과 눈물 사이/ 살기 위해 버둥거리는/ 어두운 맨땅을 보았다/ 그것이 고독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그런 미흡한 말로 표현되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그 맨땅에다 시 같은 것을 쓰기 시작했다”고 ‘늙은 코미디언’에 썼다. “서정의 얇은 머플러로 어깨를 덮고/ 때로 시인처럼 리듬을 탔지만/ 상처를 교묘히 숨기고/ 긴 그림자를 갖고 있었지만/ 나의 옷은 허사(虛辭)로 쉬이 낡아갔다/ 오직 나만의 슬픔과 기쁨으로 짠 피륙은 없을까”(‘나의 옷’)라고 쉼 없이 자신을 벼리는 문정희의 시 쓰기에 대한 저주와 축복은 이렇게 이어진다.
“산다는 것은/ 거미줄을 타고 오르는 것/ 곡예를 하듯 오르고 또 올라가 보면/ 아무것도 없지/ 허공뿐이지// 산다는 것은/ 시를 쓰는 것은/ 거미줄을 타고 허공을 오르는 것이라고// 거미줄에는 이슬 몇 알이 전부/ 하지만 그 거미줄과 이슬이/ 어느 거대한 건축보다 부동산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는/ 저주받은 비극의 눈을/ 그 축복을 시로 쓰네// 나는 시를 쓰네/ 나는 시를 사네”(‘나는 거미줄을 쓰네’)
조용호 문학전문기자 jho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총선 민심이 백지수표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4/25/128/20240425520860.jpg
)
![[현장에선] OTT들의 구독료 배짱 인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3/14/128/20240314519728.jpg
)
![[오늘의시선] 산으로 가는 연금개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1/05/128/20230105519484.jpg
)
![[세계와우리] 한국의 안보 포트폴리오와 ARF](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2/15/128/2024021551955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