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망의 투사일 뿐 희망은 아냐
지금 누군가 함께할 수 있다면
자기기만 필요 없는 행복 느껴
나는 아직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 비확진자는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뜻이란다.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 말에 불편할 일도 아니다. 사회성이 부족한 건 단점이 아니라 특징일 뿐이다.
학교에서 대면수업은 하지만 식당은 이용하지 않는다. 외식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유난 떨 일은 아니다. 처음엔 아버지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병환 중이시니 내가 걸리면 아버지가 위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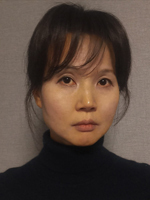
아버지는 오미크론이 유행하기 직전에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위독해지면서 나는 운동을 시작했다. 그즈음에 어떤 가수에게 입덕도 했다. 무언가에 무게를 실어야지만 균형을 잡을 수 있던 시기였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습관이 남았다. 여전히 운동하고, 운동할 때 아버지를 생각한다. 그 가수도 여전히 좋아한다. 이제 좋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마음은 거둬지지 않는다. 아버지에게 그 가수의 유튜브 동영상을 보이며 자랑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돌아가시기 3주 전 일이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어떤 일상이 펼쳐질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뉴스에서는 연일 ‘보복 소비’, ‘보복 여행’, 명품 소비가 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경기가 되살아나서인지, 아니면 자본주의 속물 경제의 이면인 건지도 잘 모르겠다.
정부도 국민의 욕망을 재생산하는 시스템을 적극 가동하는 듯하다. 국가의 역할이 국민에 대한 서비스업을 대행하는 것, 욕망을 부흥시키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새 정부도 코로나19로 잃은 일상에 대한 보상심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을 희망으로 보는 듯하다. 이전처럼, 이전보다 더 소비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선언처럼 들린다.
부동산은 다시 오르고, 오픈런(매장 문을 열자마자 달려가 구매하는 것)은 트렌드가 되었다. 명품만이 아니라 포켓몬빵도 오픈런의 대상이 되었다. 희귀템을 얻으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프리미엄을 얹어 리셀(되팔기)도 한다. 샤테크(샤넬 재테크)만 있는 것이 아니다. 포테크(포켓몬빵 재테크)도 있다. 시장경제를 교란하는 행위지만, 거대기업의 합법적인 교란행위에 비하면 차라리 아무것도 아니다. 개인 소비자는 거대기업을 모방하고, 거대기업은 소비자의 욕망을 모방한다. 기업이 생산물량을 제한해 소비자의 욕망을 더 자극하는 헝거 마케팅(hunger marketing)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득템한 사람은 역설적으로 헝거 마케팅에 낚인 사람이다.
희귀템은 인정욕망을 불러일으킨다. 청년 세대가 오픈런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들의 박탈감과도 닿아 있다. ‘플렉스’는 외려 결핍의 이면인 것이다. ‘집’이라는 자신의 공간을 자랑할 수 없다면,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물건으로 인정받고자 한다. SNS는 욕망의 폐쇄회로다. 그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의 욕망을 빠르게 모방하며 질투하고 경쟁한다. 그러는 사이, 샤넬이 희귀템이 아니라 대중적인 것이 되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명품관 오픈런의 현장에는 샤넬백이 흔하단다. 샤넬백이 더 이상 구별 짓기의 품목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제 사람들은 더 비싸고 더 희귀한 것에 쏠릴 것이다.
코로나19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보상심리로 보복 소비를 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를 향한 희망일까.
이 마음들은 희망이 아니다. 욕망의 투사다. 희망은 보상심리에도, 보복 소비에도 있지 않다. 차라리 희망은 코로나19로 희생당한 사람에 대한 슬픔에 있을 것이다. 영국은 희생자 추모 웹사이트 ‘리멤버 미’를 만들었다지만, 이런 플랫폼 형식이 아니라 동시대 개인으로서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애도의 시간에 자신을 위한 맹목적인 보복 소비는 들어설 곳이 없을 것이다. 희생자를 수치로만 인식하지 않고 한 인간의 삶으로 수용할 때 우리 시대에 희망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축어적 인식에 익숙하다. 행복이나 즐거움 같은 단어는 좋은 거고, 고통이나 슬픔은 나쁜 것으로 이분화한다. 고통이 어떻게 겸허와 연대로 이어지는지, 슬픔이 어떻게 제3의 길을 찾게 만드는지 생각지 않는다. 희망은 차라리 절망이나 슬픔 안에 있다. 이 시대, 희망은 ‘멜랑콜리’에 있는 것이다.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영화 ‘멜랑콜리아’도 ‘우울’이 아니라 ‘희망’에 대한 영화다. 행성이 지구를 향해 달려오는 상황에서 충돌은 없을 것이라 믿던 과학자는 죽음을 택한다. 충돌이 없을 것이라 믿은 건 거짓 희망이며 자기 욕망의 투사였다. 욕망의 투사를 희망처럼 믿던 사람은 자살했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였던 자매는 그 충돌의 한가운데로 나아가 서로를 보살폈다. 희망은 ‘함께’에 있었다. 멜랑콜리(우울증)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블루’(코로나 우울증)도 ‘함께’할 누군가가 있다면 희망으로 넘어갈 수 있다.
세상을 ‘나’ 중심으로만 보면 ‘나’는 늘 피해자다. 피해자 정체성에 우울과 보상심리가 따른다. 보복 소비는 미래의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나, 희망은 미래를 향해 있지 않다. 성취 여부와도 상관없다. 지금, 사랑하는, 보살펴 주고 싶은 누군가와 함께 있다면 그 자체로 희망이다. 우리는 멜랑콜리 속에서 행복할 수 있다. 이 행복은 ‘나는 행복하다’는 자기기만이 필요 없는 행복이다. 희망은 현재형이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총선 민심이 백지수표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4/25/128/20240425520860.jpg
)
![[현장에선] OTT들의 구독료 배짱 인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3/14/128/20240314519728.jpg
)
![[오늘의시선] 산으로 가는 연금개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1/05/128/20230105519484.jpg
)
![[세계와우리] 한국의 안보 포트폴리오와 ARF](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2/15/128/2024021551955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