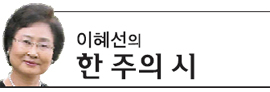
문 덕 수
만나면 문득 빛나는 그대 이마
물속에서 잠시 솟은 새벽 섬이다.
버스 안에서 흔들리고 있는 꽃봉오리들도
구두를 닦고 있는 별들의 땀방울도
저마다 외딴 섬이다.
한둘이나 두셋씩 반짝이다 사라지는
그 뒤에는 무덤 같은 빈 거리만 남고
늘어선 겨울 가로수만 유령처럼 남는다.
눈과 눈이 반짝하고 마주칠 때
입김과 입김이 엇갈려 아지랑이처럼 피고
잔잔한 마음의 물살이 퍼져나가나
물속에서 잠시 솟았다 잠기는 바위 끝.
만나면 문득 빛나는 그대 이마
물속에서 잠시 솟은 새벽 섬이다.
버스 안에서 흔들리고 있는 꽃봉오리들도
구두를 닦고 있는 별들의 땀방울도
저마다 외딴 섬이다.
한둘이나 두셋씩 반짝이다 사라지는
그 뒤에는 무덤 같은 빈 거리만 남고
늘어선 겨울 가로수만 유령처럼 남는다.
눈과 눈이 반짝하고 마주칠 때
입김과 입김이 엇갈려 아지랑이처럼 피고
잔잔한 마음의 물살이 퍼져나가나
물속에서 잠시 솟았다 잠기는 바위 끝.
장 그르니에의 ‘섬’을 비롯해서 섬을 노래한 시인들이 많다. 그중에서 문덕수 시인은 ‘잠시 솟았다 잠기는 바위 끝’으로, 결코 다가갈 수도, 몸 포개어 하나가 될 수도 없는 섬을 노래한다.
‘그대 이마’는 만나면 문득 빛나기는 하지만, 해뜰 무렵 눈부신 햇살 속에 희여스름 솟아나는 희망 같은 ‘새벽 섬’이기는 하지만 돌아서면 ‘무덤 같은 빈 거리만 남’는 공허이며 절망이다. ‘버스 안에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은 모두 저마다 꽃송이를 안고 있는 꽃봉오리이고, 거리에서 저마다 생업에 종사하느라 땀 흘리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별처럼 빛나는 자아(自我)의 개체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들이 반짝이다 사라진 뒤에는 ‘늘어선 겨울 가로수만 유령처럼 남는다.’
 |
| 그림=화가 박종성 |
우리 모두 벌레집 같은 아파트의 문을 열고 저마다 골방에서 나와 밝은 햇살 아래서 손을 내밀어 보자. 작은 꽃 이백 개가 모여 큰 꽃 한 송이를 피우는 민들레처럼, 꽃이 진 자리에 이어서 쉬지 않고 꽃을 피우는 무궁화처럼, 손에 손을 잡으면 서로의 따스한 체온이 얼어붙은 섬들의 핏줄기를 녹이리라. 그러면 ‘입김과 입김이’ 아지랑이처럼 피어나고 ‘잔잔한 마음의 물살이 퍼져나가’ 온 세상 사람이 서로 손잡는 큰 꽃을 피우고, 그 꽃향기 바다를 건너 하늘까지 닿아 제각기 홀로인 섬들도 모두 일어나 손을 내밀리라.
이혜선 시인·문학박사
<세계섹션>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정미칼럼] 시험대 오른 윤·이 회동](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9/06/128/20220906524472.jpg
)
![[설왕설래] 요지경 아파트 이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4/22/128/20240422518726.jpg
)
![[기자가만난세상] 고향사랑기부제, 감정 호소 탈피해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4/22/128/20240422518482.jpg
)
![[최종덕의우리건축톺아보기] 인공지능 시대의 건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1/27/128/20231127516986.jpg
)








